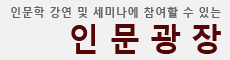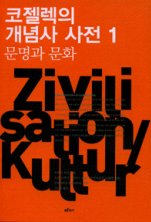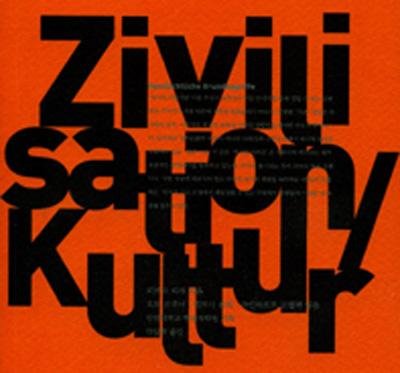
고전 라틴어에서 문화는 농경 활동을 가리켰으나 점차 한 집단 내에서의 제의적이거나 지적인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중세에도 이 개념은 부분적으로 전수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시빌리타스civilitas’라는 공동체적·정치적 요소가 더욱 보강되었다.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생겨났다. 독일어에서는 전통적인 표현인 ‘문화Kultur’가 계속 쓰였고, 프랑스어와 영어에서는 ‘문명civilisation’이라는 새 조어가 사용되었다. 두 개념 다 인간이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에 대해 행하는 활동 전체를 가리켰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개명된 인간의 모습, 개척된 자연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생산품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든 결과물을 가리키게 되었다.
…
18세기 후반에 ‘문화Kultur’와 ‘문명civilisation’이라는 두 상이한 표현들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언어사적 우연이었다. 언어적 표현이 지칭하는 실제 대상은 최소한 그 기본 특징들로만 봤을 때 여러 언어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는 19세기 말까지도 그러했고 대체적으로 보건대 1914년까지도 그러했다. 이 두 개념은 본질적으로 유럽 공통적인 자의식과 우월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사회적 차이뿐만 아니라 국민국가적 차이까지도 종속적인 역할에 머물 따름이었는데, 특히 독일어에서 그랬다. 독일어권에서는 ‘문명’이란 말도 상당히 전파되었다. ‘문화’와 ‘문명’을 구별하려는 시도들은 20세기에 이르기까지도 미미한 채로 머물다가 양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비로소 일시적으로 첨예한 국수주의적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개념의 위기는 진보의 위기 그리고 20세기에서의 유럽의 쇠퇴라는 큰 맥락에서 볼 때, 한층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표현의 이중성이 이제야 그 작용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문명’은 모든 언어들에서 부정적인 양상들을 수용하는 관점이 된 한편, ‘문화’는 회의되지 않는 가치 개념으로 남거나 또는 서구어들에서 올바르게 쓰이게 되었다.
…
그리스어에서…문화 개념과 가장 근접한 말은 ‘교육Paideia, Erziehung’과 ‘교양Paideusis, Bildung’이다. 이 두 표현은 ‘아이Pais, Kind’의 파생어인데, 물론 그렇다고 아동 교육에만 한정되어 쓰이는 것은 아니다.
…
고전 라틴어에서 출발점은 동사 ‘colere’다…이 동사의 과거분사인 ‘cultus’로부터 두 개의 명사가 파생되었는데, ‘cultus’와 ‘cultura’가 그것이다…‘colere’는 두 가지 주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거주하다’, ‘머물다’라는 의미이여 두 번째는 ‘돌보다’, ‘경작하다’이다. ‘cultus’와 ‘cultura’는 두 번째의 의미 영역만을 가리킨다…‘돌봄’이라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교육이나 존경의 의미 또는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의미로 쓰이게 된다…그러니까 ‘교양Paideia, Buldung’은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의 한 양상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핵심적 의미가 되지 못한다.
…
그러니까 ‘cultus’와 ‘cultura’는 인간이 작용하여 자연으로부터 존재하는 것 이상을 만들어낸 것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끊임없이 구별시켜 주는 그 무엇의 전체 영역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cultus’와 ‘cultura’는 그런 과정과 활동은 물론이고 그 결과도 아울러 지칭한다…‘cultus’와 ‘cultura’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인간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한, 그것의 가장 중요한 유사 개념은 바로 ‘인문 교양humanitas’이다.
…
문명 개념의 경우…출발점은 시민이란 의미의 ‘civis’이며, 여기서부터 형용사 ‘civilis’가 파생되는 것이다. ‘civilis’와 ‘civilitas’는 드물지 않게 ‘humanus’와 결부되곤 한다…이따금 ‘colere’, ‘cultus’, ‘cultura’와 같은 단어와의 결합도 이루어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culturs’ 및 ‘cultura’와 비교해 볼 때 세 가지 차이점이 중요하다. 1) 최소한 형용사 ‘civilis’에서는 개념 내의 차이점, 즉 거칠고 야만적이고 비문명화된 것으로부터의 경계선이 한층 두드러지고 그것을 구별하는 일이 좀 더 빈번하다…근대에 이르러서도 거칠고 야만적인 사람들에 대한 반대어는 문화인보다는 오히려 문명인이 쓰였다…2)‘civilis’와 ‘civilitas’는 항상 긍정적으로 사용된다…3)로마에서는 ‘civilis’가 정치적 요소를 잃지 않고 있다. 즉 이 형용사는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기인한다. 이에 반해 ‘colere’는 그 어원으로부터 고찰해 볼 때 정치적 부수 어감이라곤 조금도 없다. 이 동사는 농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인간의 개별 활동을 지칭했다…어원의 의미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civilis’와 그 파생어들에서는 정치적 요소들이 자꾸만 그 빛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반면 ‘cultura’가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될 경우도 자주 나타나게 될 것이다.
…
모든 언어에서의 온갖 부정적인 측면들이 점점 더 문명 개념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반면, 문화 개념은 정신적인 것과의 밀접한 연관 덕분에 근본적으로 ‘하나의 이상’이라는 특징을 유지하거나 이제야 비로소 획득했다…영어의 영향을 받아 ‘문화’가 인간 활동의 모든 형식들과 그 활동의 결과물들을 지칭하는 학술 개념으로 점점 더 강하게 관철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문명’은 점점 더, 고도로 발달된 특수한 한 문화에 대해서만, 자주 현대 서양 문화에 대해서만 사용된다…사람들은 문화를 전반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서 문명을 비판할 수 있다. 말하자면 문화는 인간적 가치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
(민족학적 전문 개념의 경우와 같은 개념 이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들이 다수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볼 때 ‘하위 문화Subkultur’에서부터 ‘노동자 문화Arbeiterkultur’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분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기야 이러한 세목별 나열은 이 영역들이 처음부터 ‘문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 사실은 다른 복합어들, 이를테면 ‘정치 문화politische Kultur’나 ‘음식 문화EBkultur’와 같은 복합어들의 경우 더욱 분명해진다. 정치야말로 문화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에서의 특정한 측면들을 문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수는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문화’는 1945년 이후의 독일어에서, 한 집단 혹은 한 민족의 정신적·예술적 업적들을 지칭하기 위한 제한적인 개념으로서 또 그 때문에 의심할 나위 없이 긍정적인 개념으로서 최후의 개선凱旋 행진을 했다…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출발점은 달랐지만 발전 과정은 동일했다. 즉 ‘문화’가 ‘문명’을 희생시킨 채 점점 더 확고한 기반을 굳히게 된 것이다.
프랑스어의 일반적인 어법에서는 계속해서 ‘문명’이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지배적 역할을 한다. ‘문명’이 자신의 옛 우선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현대 세계의 의심스러운 측면들도 ‘문명’과 결부되는 일이 증가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문명’은 제국주의적 과거로 인한 부담을 지게 된다. “도처에서, 우리의 ‘문명’의 거친 또는 부드러운 침입하에, 이 민족들의 지적·정신적 문화가 대화를 거부한 채 영혼의 깊은 곳으로 도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상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다시 ‘문화’를 불러오기를 원했다…“이러한 정신의 요구, 이러한 영혼의 비약, 즉 내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부르고자 하는 것이 더 이상 생명을 불어넣어주지 않을 때” 문명은 죽는다. 문화가 없으면 문명은 심지어 “야만보다 더 위험한 것”이 된다. 페스탈로치의 ‘문명의 타락’이 다시 등장한다…나부어는 1952년에 ‘문화’를 ‘문명’의 “정신spirit”으로 그리고 ‘문명’을 ‘문화’의 “육체body”로 정의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는 한 문명의 예술, 철학, 문학, 종교의 총합을 나타내며, 문명은 인간의 공동체에 질서를 부여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 장치들을 대표한다.”
…
‘문화’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은 결국 국제적 틀 속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국제연합UN의 산하기구인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자신의 명칭 속에 ‘문명’이 아니라 ‘문화’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또 다른 언어사적 특수성이 나타난다. 영어와 프랑스어의 경우 ‘문화’만이 흔히 사용되는 형용사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즉 ‘civilizational’은 어색하며, ‘civilisateur’는 ‘culturel’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