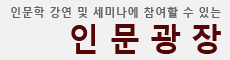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삶이 내게로 걸어들어온 것이다. 어쩌면 다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다시 인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데에서 잠들어 동사해가던 나의 영혼이 다시 숨을 쉬었고, 졸린 듯 작고 약한 날갯짓을 시작했다. (...) 한 소녀가 나에게 먹으라고, 마시라고, 자라고 명령했고, 나에게 친절을 보였고, 나를 비웃었고, 나를 어리석고 작은 소년이라고 부른 것이다.
- 헤르만 헤세, 김누리 옮김, <황야의 이리>, 민음사, 2013, 144쪽.

하리 할러는 헤세의 주인공들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시민적 삶에 강한 혐오감을 드러낸다. 하리 할러는 도시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대중적 삶’에 대한 양가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리 할러는 시민적 삶의 안정감에 희미한 동경을 느끼면서도 그 속물성과 안정감을 증오한다. 시민사회의 속물근성이 자신의 야생적 충동을 가로막고 무의식의 무한질주를 방해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실 시민적 일상이 주는 안정감은 ‘이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집단최면을 걺으로써 그 사회의 온갖 모순을 은폐하는 기능을 한다. 하리 할러는 자신이 그 안정감에서 완전히 탈주하지 못한 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표류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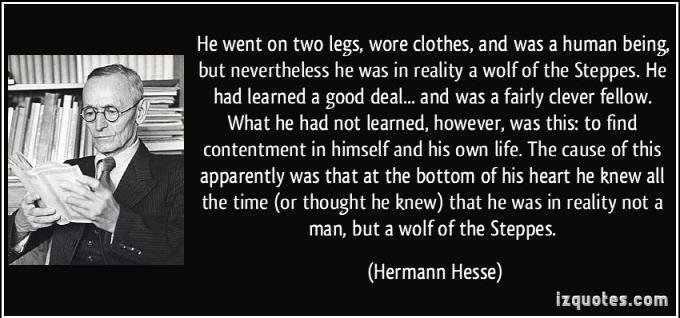
할러는 어디서나 자신을 뭔가 안됐다는 얼굴로,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지쳐 있었다. 그것은 극심한 자기검열 때문이기도 했다. 그가 자신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니 남들의 시선에 더욱 예민해지고 결국 지인들끼리의 평범한 만남조차 심각한 파국으로 끝나버리게 되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무심코 찾아간 한 술집에서 한 여인을 만나 뜻밖의 대화를 하고 나서 그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자신을 너무 ‘이질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을 너무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깨달은 것이다. 이름도 모르는 그녀, 처음 만난 그녀는 하리 할러의 온갖 횡설수설을 다 받아주었다. 구원의 여신상처럼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어조가 아니라, 너무나 일상적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리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고, 하리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할러는 전혀 불쾌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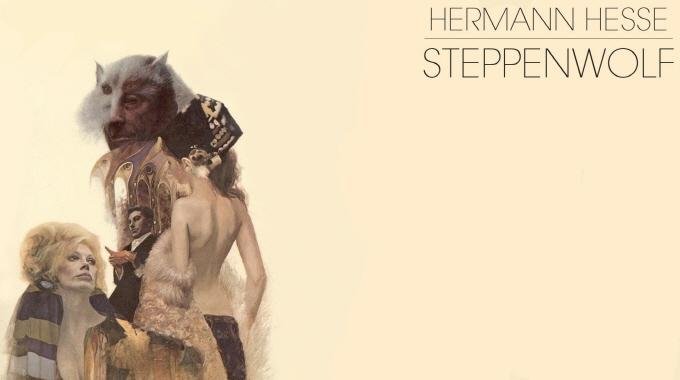
그녀는 하리의 야수성에도, 하리의 시민성에도 괘념치 않은, 하리를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 준 첫 번째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눈짓과 발짓과 손짓은 마치 하리와 독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당신은 전혀 특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그냥 편하게 살아봐요.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에조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봐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당신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리 할러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누구에게도 솔직하지 못했다. 어떻게든 자신의 본모습을 숨기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하리는 처음으로 정직한 본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친친 동여매고 있었던 강력한 자기방어기제가 풀리게 된다. 타인에게 솔직해지는 것,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 자기해방의 첫 번째 열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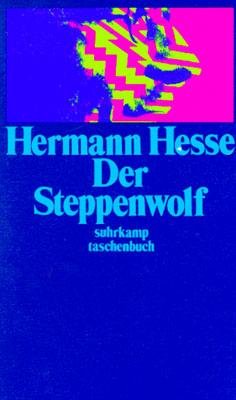
그녀, 이 이상한 여자 친구는, 또한 성인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내가 아무리 이상하고 터무니없는 일을 한다 해도 절대 이해받지 못하는 외톨이가 아니며, 병적이고 예외적인 존재도 아니라고 일러주었다. 내게도 형제가 있으며 사람들이 나를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래, 분명히 만날 수 있다. 그녀에게는 믿음이 갔다.
- 헤르만 헤세, 김누리 옮김, <황야의 이리>, 민음사, 2013, 14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