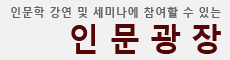다른 나라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읽고 부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조금 낫지만 처음 보는 낯선 이름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죠. 제 이름만 해도 부르기가 쉬울 것 같은데 외국인 친구들은 어려워하더군요. 한번에 ‘미선’이라고 부르질 못하고 ‘미’ 다음에 잠시 멈췄다가 강하게 ‘썬’이라고 해요. 한 클래식 음악 방송 진행자는 곡명과 연주자들을 소개할 때마다 심하게 버퍼링을 일으키더군요. 저도 유학생들을 부를 때면 우리말로 적어 놓은 이름을 슬쩍슬쩍 훔쳐봅니다. 안 그러면 이름을 잘못 부르는 실수, 아니 실례를 범하게 되니까요. 베트남 학생 중에는 ‘Nguyen’ 성을 가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모르고 ‘느구옌’이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웃으면서 ‘응우옌’이라고 고쳐주더군요. ‘Trang’은 ‘트랑’이 아니라 ‘짱’이랍니다. 정확한 이름의 기준은 그 이름의 주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거나 읽을 때는 그 이름의 주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정확하게 불러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출판사에서도 이 원칙을 따르는 것 같아요. 외국어이름의 한글 표기법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표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Plátōn’은 ‘플라톤’, ‘Sigmund Freud’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Felix Medelssohn’은 ‘펠릭스 멘델스존’으로 통일해서 표기합니다. 그런데 영어가 국제 공용어로 통용되다 보니 영어식 발음이 더해져서 이름을 읽는 일이 더 힘들어졌어요. ‘플레이토우’, ‘시그먼드 프로이드’, ‘펠릭스 멘들슨’이라고 하지 않으면 영어 사용자들은 이 이름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미국인 친구에게 멘델스존의 『무언가Lieder ohne Worte』 악보를 선물하면서 ‘멘델스존’이라 했더니 못 알아 듣더군요. 그러니 이름 주인의 모국어 이름 및 우리말식 표기 이름, 영어 이름을 다 알아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Meisje met de parel』1665의 작가는 한때 ‘요하네스 베르메르’라 표기되다 지금은 네덜란드어식 발음으로 ‘요하네스 페르메이르Johannes Jan Vermeer, 1632~1675’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영어식 발음, ‘조우해너스 버미어’와는 완연히 다릅니다.
 |
|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1665년. 캔버스에 유화, 44 × 39 cm.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 헤이그. |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일이 워낙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미술관을 다니다 보면 이름과 연관된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은 화가의 이름과 연관된 에피소드를 대량 방출해 보겠습니다.
1. Yves Klein
Yves Klein. 이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Yves’부터 난감하죠? ‘이베스’라고 해야 할까요? ‘Klein’은 조금 낫습니다. 유명한 패선 디자이너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덕분에 ‘Klein’은 ‘클라인’으로 읽으면 되니까요. 제가 ‘이브 클라인’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예술과 낭만의 도시 파리 미술』2010이라는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후 B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세 가지 색에 대한 미술의 역사History of Art in Three Colours - 블루』2012를 통해 ‘이브 클라인’이 만든 파란색,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International Klein blue’에 대해서도 알게 됐죠. 이후 ‘이브 클라인’의 『테네시 윌리엄스에 대한 경의Hommage a Tennessee Williams』1960를 직관하는 것이 파리 여행의 주요 목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퐁피두센터Centre Pompidou에 가서 전시실을 다 돌아봐도 『테네시 윌리엄스에 대한 경의』가 보이지 않더군요. 혹시 못 보고 놓쳤을지도 모르는 일이라 안내 데스크로 가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브 클라인의 『테네시 윌리엄스에 대한 경의』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은 전시되고 있지 않아요. 수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그 작품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실망이네요.”
“그런데 ‘이브 클라인’이 아니라 ‘이브 클랭’입니다. 프랑스인이니까 프랑스어식으로 ‘이브 클랭’이라고 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책에서도, 동영상에서도 모두 영어식으로 ‘이브 클라인’이었기 때문에 ‘Yves Klein’이 ‘이브 클랭’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
| 이브 클랭, 『테네시 윌리엄스에 대한 경의』, 1960년. 혼합재료, 275 × 407 cm. 퐁피두센터, 파리. |
프랑스어 이름 중 ‘이브 클랭’만 혼란스러운 건 아니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바르비종Barbizon파 풍경화가 장 바티스트 카미유 코로Jean Baptiste Camille Corot, 1796~1875의 그림 옆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DaubignyCharles François Daubigny, 1817~1878’의 풍경화가 거의 항상 전시돼 있습니다. 미술관에 갈 때면 코로의 그림을 항상 챙겨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Daubigny’의 그림은 자동으로 집중 감상 대상이 되곤 합니다. 처음에는 ‘도비그니’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도비니’더군요.

 |
| 위 - 장 바티스트 카미유 코로, 『저녁, 강둑에 정박해 있는 뱃사공』, 1855년. 캔버스에 유화. 루브르 박물관, 파리. / 아래 - 샤를 프랑수아 도비니, 『거룻배들』, 1865년. 패녈에 유화. 루브르 박물관, 파리. |
동영상을 보다 보면, 정물화가 장 시메옹 샤르댕Jean Siméon Chardin, 1699~1779은 ‘샤르댕’이 아니라 ‘샤르당’으로,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Jean-Auguste-Dominique Ingres, 1780~1867는 ‘앵그르’가 아니라 ‘앙그르’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를 왜 ‘아’로 발음하는지 궁금해서 프랑스에서 유학한 선생님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 파리 식이랍니다. 앞글, 「미술관에 가면 원하는 작품을 언제든지 볼 수 있나요?」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베리 공작의 성무일도서Belles Heures of Jean de France, Duc de Berry』1404~1409와 『베리 공작의 매우 화려한 성무일도서聖務日禱書Très Riches Heures du Duc de Berry 』1412~1416는 랭부르Limbourg brothers 형제들이 그린 기도서입니다. 이 세 형제들을 영어식으로 ‘림버그’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네덜란드 출신이라 네덜란드어 이름까지 가세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예요. 어쨌든 프랑스 출신 화가들의 이름은 프랑스어로 불러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인들 자신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프랑스어식으로 싹 바꿔 부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미국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Harrison Ford’를 ‘아리송 포르’라고 부른답니다.
2. Michelangelo Merisi
미켈란젤로 메리시가 누구일까요? 시스티나 성당Sistine Chapel의 천장 벽화를 그린 미켈란젤로일까요? 아닙니다. 『천지창조』1508~1512를 그린 미켈란젤로는 미켈란젤로 디 로도비코 부오나로티 시모니Michelangelo di Lodovico Buonarroti Simoni, 1475~1564입니다. 대개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로, 아니면 그냥 ‘미켈란젤로’로 불리죠. 그럼 미켈란젤로 메리시는 누구일까요?
미술에 대해 상당한 조예가 있는 선배와 함께 바티칸의 피나코테크Pinakothek를 관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카라바조Caravaggio, 1571~1610의 『그리스도의 매장Deposition』1602~1604이 보여서 선배를 그림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언니, 여기 카라바조 그림 보세요.”
작품 캡션을 본 선배가 반박했습니다.
“이게 무슨 카라바조 그림이야? 미켈란젤로 그림이네.”
“언니, ‘미켈란젤로 메리시’가 카라바조의 본명이에요.”
“정말?”
카라바조는 알아도 그의 본명이 ‘미켈란젤로 메리시’라는 것을 모르면 카라바조의 작품을 보면서도 그것이 카라바조의 작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제 수업을 듣던 한 학생도 미술관에서 카라바조의 작품을 보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줄 착각한 적이 있었다고 알려주더군요. 그렇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작품 캡션을 읽으면 카라바조가 ‘미켈란젤로 메리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ichelangelo Merisi detto il Caravaggio’는 ‘카라바조로 알려진 미켈란젤로 메리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detto’는 ‘~로 알려진’을 나타내는 이탈리아어입니다. 아래 두 번째 작품 캡션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어로는 ‘dit’고요. 영어로는 우리가 흔히 약어로 많이 쓰는 ‘a.k.a.also known as’나 그냥 ‘known as’죠. 미술관에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 있는 작품 캡션이 많습니다. 본명보다 예명으로 널리 알려진 화가들이 많다는 의미겠죠? 카라바조 외에 본명보다 예명으로 더 잘 알려진 유명한 화가로는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1445~1510가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알렉산드로 필리페피Alessandro Filipepi’입니다. 혹시 그의 본명이 먼저 표기되고 ‘보티첼리’가 뒤에 있다 해도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카라바조, 『그리스도의 매장』, 1602~1604년. 캔버스에 유화, 300 × 203 cm. 바티칸 미술관, 로마. |

 |
| 산드로 보티첼리, 『어린 세례 요한과 함께 있는 성모자』, 1470~1475년. 패널에 템페라, 90.7 × 67 cm. 루브르 박물관, 파리. |
3. Rembrandt van Rijn/Rijksmuseum
렘브란트는 다 아시죠? 미술에 대해 완전 무지했던 왕초보 시절, LA 카운티 미술관LACMA에서 렘브란트의 작품을 봤을 때 저는 작품 캡션에 적힌 ‘Rembrandt van Rijn’과 ‘렘브란트’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Rembrandt van Rijn’의 작품을 여러 점 보고 나서야 ‘Rembrandt van Rijn’이 제가 알던 렘브란트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런데 이후에도 ‘Rembrandt van Rijn’의 이름이 문제였습니다. ‘Rembrandt van Rijn’이 ‘렘브란트 반 리즌’인 줄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동영상을 보다가 ‘리즌’이 아니라 ‘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네덜란드어에서는 ‘ij’가 ‘아이’로 발음된다고 합니다. 렘브란트의 온전한 이름은 ‘렘브란트 판 라인’입니다. 국립미술관인 ‘Rijksmuseum’에도 ‘ij’가 들어 있습니다. 렘브란트 덕분에 ‘Rijksmuseum’이 ‘라익스뮤지엄’이라는 것은 쉽게 아셨을 겁니다. ‘렘브란트 판 라인’과 ‘라익스뮤지엄’은 듣기에 따라 ‘렘브렘트 판 레인’과 ‘레익스뮤지엄’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암스테르담으로 같이 여행을 간 친구는 저더러 ‘룩스뮤지엄’인데 왜 자꾸 ‘라익스뮤지엄’이라고 하느냐며 핀잔을 주더군요. 이 친구 눈에는 ‘ij’가 ‘u’로 보인 겁니다. 나이 들어 노안이 생기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이름은 정확하게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영어로 된 동영상을 보면서 미술 공부를 하는 편이라 화가들의 영어식 이름에 더 익숙한 편입니다. 그래서 영어식 이름과 너무 다른 우리말 표기법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간혹 있죠. 『농민의 결혼식The Peasant Wedding』1567 같은 풍속화로 유명한 ‘Pieter Bruegel 1525/1530~1569’을 ‘피터 브로이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네덜란드어식으로 ‘피터르 브뤼헐’로 표기하더군요. 지명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페테르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의 고향인 ‘Antwerp’은 ‘앤트웝’인 줄 알았는데 네덜란드어식으로 ‘안트베르펜’이라고 표기되더군요. 이준 열사가 만국평화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찾았던 ‘헤이그Hague’는 ‘덴하그Den Haag’라고 합니다. 이곳의 마우리츠하위스Mauritshuis 미술관에 페르메이르의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가 있습니다.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를 보러 이 미술관을 찾아가게 되면 ‘헤이그’라고 하지 말고 현지인처럼 ‘덴하그’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
| 피터르 브뤼헐, 『농민의 결혼식』, 1567년. 패널에 유화, 114 × 164 cm. 미술사 박물관, 빈. |
4. Dante Gabriel Rosetti
런던의 테이트 브리튼the Tate Britain 미술관에서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Dante Gabriel Rossetti, 1828~1882의 『노란 옷을 입은 여자Lady in Yellow』1863를 본 다음 옆 그림을 보며 서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처럼 보이는 중년 남자 관람객이 딸처럼 보이는 소녀 관람객과 함께 로세티의 그림 앞에 멈춰서더군요. 한국인 관람객들이었습니다.
“단테의 작품이네. 너 단테 알지? 『신곡』을 쓴 시인 말이야. 시인이 그림도 그렸나 보다.”
아버지 관람객의 설명을 들으며 “아니, 무슨 말씀을! 이 단테는 그 단테가 아닙니다!”하고 끼어들까 말까 잠시 고민했죠. 이번에는 팩트 체크보다 아버지 관람객의 체면을 지켜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잠자코 있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곡Divina Commedia』1308~1321을 쓴 시인은 누구일까요? 단테 알리기에리Dante Alighieri, 1265~1321입니다. 제가 아는 한, 단테 알리기에리는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두 이름에 모두 ‘단테’가 들어 있으니 아버지 관람객이 헛갈렸겠죠?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의 원래 이름은 가브리엘 찰스 단테 로세티였다고 합니다. 시인 단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단테’를 맨 앞으로 빼서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로 이름을 바꿨다죠. 단테 알리기에리는 그림을 안 그렸지만,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는 시인이면서 화가였습니다. 아내가 사산 후 약물 과다로 죽었을 때 무덤 속에 출판하지 않은 시들을 함께 묻었다고 하네요. 문제는 나중에 무덤을 열고 원고를 꺼내서 시집을 출판했답니다. 영국판 『전설의 고향』이죠? 원고를 파일로 저장해두는 오늘날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이 부녀 관람객 사건 이후에는 강의 중에 ‘단테’를 언급할 때면 꼭 ‘알리기에리’까지 붙여서 말하곤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단테는 성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필명입니다. 본명세례명은 두란테 디 알리기에로 델리 알리기에리Durante di Alighiero degli Alighieri랍니다.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나 라파엘로Raffaello Sanzio도 이름으로만 불리는 경우가 많죠. 흔치 않은 이름인데다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라 굳이 성을 붙일 필요가 없었나 봅니다. 이탈리아 이름도 쉽지 않죠?
 |
|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노란 옷을 입은 여자』, 1863년. 종이에 수채, 40.6 × 30.5 cm.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 런던. |
5. 미스 판 데어 로에
계절학기 영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건축학과 학생이 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 두 학생과 건축가들에 대해 잠시 수다를 떨었어요. 화제가 건축가 안도 다다오Tadao Ando, 1941~ 에서 시작해서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í, 1852~1926와 프랭크 게리Frank Gehry, 1929~ 를 거쳐 독일 건축가로 넘어갔습니다.
“내가 그 여자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하는데 ‘미스 반 데어 로에’라는 독일 건축가가 있죠?”
“‘그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남자라고요? 그런데 왜 이름 앞에 ‘미스’라는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Miss’가 아니고 ‘Mies’입니다. 머리숱이 많이 빠져서 탈모까지 된 아저씨입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다른 여성 예술가들 이름 앞에 ‘미스’라는 호칭을 붙이는 경우는 보질 못했거든요. 왜 이 사람 이름 앞에만 ‘미스’를 붙여 주나 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무심히 넘겼어요. ‘미스’ 때문에 당연히 여성인 줄 알았죠. 두 사람 덕에 새로운 걸 알았어요. 고마워요.”
미술 동영상을 보다 알게 된 건축가다 보니 이름의 철자까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생긴 착오였습니다. 계절학기가 끝나고 방학 동안 『미들섹스Middlesex』2002라는 소설을 읽다 보니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지은 건물에서 앤디 워홀Andrew Warhola, 1928~1987의 전시회를 여는 내용이 나오더군요. ‘반’은 영어식 발음이고 ‘판’이 독일식 발음이겠죠? ‘미스 판 데어 로에’는 본명인 마리아 루트비히 미하엘 미스Maria Ludwig Michael Mies에서 루트비히 미스 판 데어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 1886~1969로 개명했답니다. ‘루트비히’는 빼고 성인 ‘미스’를 살려서 ‘미스 판 데어 로에’만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저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생기죠. ‘미스’ 때문에 ‘루트비히 미스 판 데어 로에’를 여성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루트비히 미스 판 데어 로에, IBM 플라자, 시카고, 일리노이.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2004-09-02_1580x2800_chicago_IBM_building.jpg#/media/File:2004-09-02_1580x2800_chicago_IBM_building.jpg 제공. |
6. Andrei Rublev
이 이름은 발음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나요? ‘안드레이 루블레프’라고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실제로 ‘안드레이 루블레프’라고 표기해 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름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미하일 고르바초프1931~2022 소련 전 대통령을 기억하시나요? ‘고르바초프’의 영어식 표기는 ‘Mikhail Gorbachev’입니다. ‘Rublev’에도 ‘ev’가 있으니 ‘루블레프’가 아니라 ‘루블료프’가 맞겠죠? 러시아어로는 ‘ev’가 ‘오프’ 혹은 ‘요프’로 발음된다고 합니다. 안드레이 루블료프1360년대~1427-1430는 이콘화의 대가로 대표작은 『삼위일체Trinity』,1411 혹은 1425~27입니다. 아래 사진은 유리관 때문에 조명도 반사돼 있고, 그림 아래로 제 다리도 보여서 형편없는 사진이긴 하지만, 사진 속 파란색이 그림의 원래 파란색을 상당히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구글 이미지나 책에 실린 그림 사진들은 파란색이 너무 진하게 나와서 작품의 원래 색깔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프랑스어 이름과 네덜란드어 이름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어 이름 역시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이 셋 중에서 러시아어 이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프랑스어나 네덜란드어와 달리 러시아어는 발음을 추측하기가 아예 불가능하니까요. 미술 공부를 하다가 가장 많이 접하는 미술관 이름 중 하나는 ‘예르미타시’일 거예요. 러시아어로는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рмитаж’이고 영어로는 ‘The State Hermitage Museum’이죠. 그런데 이 미술관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표기됩니다. 어떤 책에서는 ‘에르미타슈’, 또 어떤 책에서는 ‘에르미타주’, 또 어떤 동영상에서는 영어식으로 ‘허미티지’라고 부르더군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호텔 직원에게 미술관 이름을 읽어 달라고 부탁했더니 ‘예르미타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정확한 발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발음과 러시아 사전 발음을 들어보면 ‘이르미타쉬’[ɪrmʲɪˈtaʂ]에 가깝습니다. 미술관 이름을 어떻게 표기할까 고민하다가 몇 년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예르미타시 특별전」제목처럼 이 글에서는 ‘예르미타시’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어 이름은 다 어렵지만, 아래 이름은 특히 더 난감합니다. 아래 이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Sylvester Shchedrin.’ ‘shch’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에곤 실레Egon Schiele, 1890~1918의 이름에서 ‘sch’만 있어도 난감한데 이 이름에는 ‘shch’ 네 글자가 있습니다. ‘Shchedrin’을 ‘Chtchedrin’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군요. ‘chtch’가 더 어려워 보이죠? 풍경화로 유명한 ‘실베스터 셰드린1791~1830’입니다. 영어 동영상에서는 ‘쉬드린’이라고 하더군요. 러시아어 이름과는 죽을 때까지 씨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접하다 보면 조금 익숙해질 날이 오겠죠?
 |
| 안드레이 루블료프, 『삼위일체(Trinity)』, 1411년 혹은 1425~1427년. 패널에 템페라, 142 × 114 cm.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모스크바. |
 |
| 실베스터 셰드린, 『소렌토의 테라스』, 1825년. 캔버스에 유화.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모스크바. |
7. 자오맹푸Zhao Mengfu
다음은 중국 화가들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 자오맹푸Zhao Mengfu
② 니잔Ni Zan
③ 리쳉Li Cheng
④ 판콴Fan Quan
⑤ 구오시Guo Xi
중국어 이름이 이렇게 병음拼音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중국어 이름을 우리말식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이름이 우리말식 한자어 발음이 아니라 중국어식 발음으로 표기되면서부터 인명, 지명 할 것 없이 중국어 이름이 러시아어 이름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모택동毛泽东’이 아니라 ‘마오쩌둥Máo Zédōng’으로, ‘두보杜甫’는 ‘두푸Du Fu’로, ‘이백李白’은 ‘리바이Li Bai’로 표기되더군요. 명나라 시대 화가이자 서예가인 동기창董其昌, 1555-1636이나 송나라 휘종徽宗 황제1082~1135처럼 우리가 아는 이름과 중국어 병음이 같으면 그나마 알아듣기가 쉽죠. 위에 있는 화가들 이름은 어떤가요? 저한테만 어려운가요? 1번은 원나라 때 화가이자 서예가인 조맹부趙孟頫, 1254~1322입니다. 워낙 유명한 화가이다 보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2번 역시 원나라 때 문인화의 대가인 예찬倪瓚, 1301~1374입니다. 3번은 북방계 산수화의 원조인 송나라 시대의 이성李成, 919년~967년, 4번은 북송 초기의 산수화가인 범관范寬, 5번은 북방 산수화를 집대성한 북송 시대의 곽희郭熙, 1023~1085입니다. 우리말식으로 표기하니까 다 들어본 이름인 것 같죠?
 |
| 니잔, 『육군자도六君子圖』, 1345년. 종이에 묵, 61.9 × 33.3 cm. 상하이 박물관, 상하이.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i_Zan_-_Six_Gentlemen.jpg#/media/File:Ni_Zan_-_Six_Gentlemen.jpg 제공. |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상황이 조금 나아집니다. 작품 캡션이 한자와 영어로 표기돼 있으니 눈치껏 작가와 제목을 알아맞힐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작가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직원에게 중국어식 이름으로 물어봐야 하는데 그걸 모르니 질문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고 영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한자 이름을 찾아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러니 중국 화가들의 이름을 중국어식으로 발음할 줄 모른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 세상의 모든 화가들에게 다 해당할 것 같아요. 화가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할 줄 모른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술 감상자에게 중요한 것은 화가의 이름이 아니라 작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