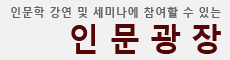리움 미술관의 고미술관 회화 전시실에서 그림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앞에 있던 두 관람객이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더군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야?”
“전이징이래. ‘전’이 성이고 ‘이징’이 이름인가 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상이 맞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전’은 성이 아니라 ‘~라고 전해지다’라는 뜻이에요. ‘전 이징’은 ‘이징 작품으로 전해진다’는 말입니다.”

 |
| 전(傳) 이징, 『산수도』, 16세기, 종이에 수묵, 98.6 × 54.1 cm. 리움 미술관, 서울. |
묻지도 않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아는 척하며 끼어들면 얼마나 재수 없어 보일지 저도 압니다. 직업병인 것 같아요. 작가의 이름이 두 자였다면 두 관람객이 ‘전’을 성으로 착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름이 하필 외자다 보니 ‘전’이 성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작품 캡션을 조금만 신경 써서 읽었다면 ‘전’을 성으로 착각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한글 ‘전’ 다음에 괄호 안에 한자어 ‘傳’이 붙어 있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이징’이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전(傳) 이징.’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이곳 회화 전시실 입구에는 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작품 캡션에 ‘전(傳) 신사임당’이라고 적혀 있죠. 두 관람객이 이 작품들을 미리 봤더라면 ‘전’을 성으로 착각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사임당’의 성을 ‘전’으로 읽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누구의 작품인지 출처provenance가 불분명하지만 ‘누구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작품은 전칭작傳稱作 혹은 전작傳作으로 불립니다. 작가가 누구인지, 소장자가 누구였는지 출처가 불분명하면 ‘작자미상作者未詳’ 작품으로 간주되고요. 출처가 분명한 작품은 ‘진작眞作’이라 불립니다. 작자미상 작품이나 전칭작의 경우 출처를 보증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면 당연히 진작으로 인정받게 되죠. 전칭작의 경우에는 작품 캡션에서 화가 이름 앞에 ‘전傳’을 붙여서 그 작품이 전칭작임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신사임당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화훼초충도』16세기에는 ‘전 신사임당 傳 申師任堂(1504~1551)’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
| 전 신사임당, 『화훼초충도』, 16세기. 종이에 색.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
우리나라에서 ‘전傳’으로 전칭작을 표시한다면, 다른 나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전칭작을 어떻게 표기할까요? 전칭작 표기 방법 중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가 이름 다음에 ‘의문부호?’를 다는 방법입니다. 작품을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화가의 이름 옆에 의문부호를 달아서 누가 그린 그림인지 출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죠. 빈의 미술사 박물관Kunsthistorisches Museum이 이런 방법을 쓰고 있더군요. 예를 들어, 캥탱 마시Quentin Massys, 1465/66~1530가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수도원의 작은 방에 있는 성 히에로니무스Hl. Hieronymys in der Zelle』의 작품 캡션에는 ‘Quentin Massys (?)’라는 표시가 있고, 캥탱 마시가 단독으로 그린 그림인지 불확실하다는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
| 캥탱 마시, 『수도원의 작은 방에 있는 성 히에로니무스』. 57 × 77 cm. 미술사 박물관, 빈. |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의문부호로 전칭작을 표시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박물관에서는 『모나리자Mona Lisa』1503나 『밀로의 비너스Vénus de Milo』B.C. 101?를 보려면 우르르 몰려가는 관람객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 『밀로의 비너스』에도 의문부호가 있죠? 작품 제작 연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의문부호가 사용되는 겁니다. 의문부호가 여러 가지로 유용하죠? 관람객들로 득실대는 『모나리자』 전시실 옆 작은 방에 높이 16cm × 폭 60cm 크기의 작은 『수태고지L'Annonciation』 그림이 걸려 있더군요.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의 『수태고지』1472와 상당히 비슷해 보였습니다. ‘아니, 여기에 레오나르도 다 빈치 그림이?’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으로 작품 캡션을 보니 “로렌조 디 크레디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 빈치 ? Lorenzo di Credi ou Léonard de Vinci ?”라고 표기돼 있더군요. 물론,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수태고지』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수태고지』는 많이 다릅니다. 우선, 크기부터 다르죠.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수태고지』가 네 배 정도 큽니다. 성모 마리아의 자세도 완전히 다르고요. 아래 두 사진을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 전 로렌조 디 크레디 혹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 『수태고지』. 패널에 유화, 16 × 60 cm. 루브르 박물관, 파리. |
 |
| 레오나르도 다 빈치, 『수태고지』, 1472년. 패널에 유화, 98 × 217 cm. 우피치 미술관, 피렌체. |
전칭작을 표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의문부호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가장 일반적인 표기법은 ‘attributed to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뮌헨의 알테 피나코테크Alte Pinakothek처럼 자국어로만 작품 캡션을 만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술관에서는 작품 캡션에 자국어와 영어를 병기합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산수도』와 『화훼초충도』의 영어 설명에도 이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자국어가 영어인 경우에는 영어로만 표기되죠. 영어 설명이나 영어로 병기된 설명에 ‘attributed to ~’라는 말이 들어 있으면 그 작품은 전칭작입니다. 아래 왼쪽 그림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Johannes Vermeer, 1632~1675가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피리를 들고 있는 소녀Girl with a Flute』1665/1675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페르메이르의 진작인 『빨간 모자를 쓴 소녀The Girl with the Red Hat』1665이고요. 두 그림 속 소녀의 모습이 비슷하죠? 액자 모양까지 비슷합니다. 진작 결정 여부는 미술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지금은 진작과 전작의 표기 방법에만 집중해서 두 사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그림의 작품 설명에서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이름 위에 적혀 있는 ‘ATTRIBUTED TO’가 보이죠?
 |
| 왼쪽 그림 - 전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피리를 들고 있는 소녀』, 1665/1675년. 패널에 유화, 20 × 18 cm. 국립 미술관, 워싱턴. / 오른쪽 그림 –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빨간 모자를 쓴 소녀』, 1665년. 패널에 유화, 23.2 × 18.1 cm. 국립 미술관, 워싱턴. |
작품 캡션이 영어 설명 없이 자국어로만 표기돼 있다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 ‘attributed to~’에 해당하는 표현이 프랑스어attribué a건, 이탈리아어attribuita a건, 스페인어atribuido a건 모두 비슷하니까요. 독일어zugeschrieben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attributed’를 줄여서 ‘attr.’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파엘로Raffaello Sanzio da Urbino, 1483~1520의 『라 포르나리나』 혹은 『젊은 여인의 초상The Portrait of a Young Woman』1518~1519의 모작인 보르게세 미술관Galleria Borghese의 『라 포르나리나』는 라파엘리노 델 콜레Raffaellino del Colle, 1490~1556가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작품입니다. 이 전칭작의 작품 캡션에서 ‘attribuita’의 축약형인 ‘attr.’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전 라파엘리노 델 콜레, 『라 포르나리나』, 16세기 후반. 나무에 유화, 86 × 58.5 cm. 보르게세 미술관, 로마. |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전칭작 표기가 ‘attributed to ~’라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전칭작을 어떻게 표시할까요? 우리나라처럼 모두 ‘전傳’이라는 용어를 사용할까요? 중국 역시 ‘傳’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북경의 국립고궁박물원國立故宮博物院이나 대만의 국립고궁박물원에서 전칭작 작품 캡션을 찍어 오질 못했습니다. 이 글을 쓸 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사진을 찍었을 텐데요. 북경의 국립고궁박물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 전칭작 앞에는 ‘전’이 붙어 있더군요. 다만 형태가 우리나라처럼 정자체가 아니라 간자체, ‘传’로 표기돼 있습니다. 작품 캡션에 이 글자가 들어있는 작품은 전칭작이라는 뜻입니다.
 |
| 전传 미우인米友仁, 『운산묵희도云山墨戏图』(권卷), 남송. 견본에 묵필, 21.4 × 195.9 cm. 국립고궁박물원, 북경. https://www.dpm.org.cn/collection/paint/230125.html 제공. |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역시 전칭작에 ‘전’을 붙입니다. 여기도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약자, ‘伝’을 사용해서 전칭작을 표기하더군요. 같은 글자가 이렇게 나라별로 달라질 수 있다니 흥미롭죠? 정자체 ‘傳’에 익숙해져 있으면 ‘传’이나 ‘伝’이 ‘전’이라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겠죠?

 |
| 전伝 가노 모토노부, 『서왕모·동방삭도』, 16세기. 비단에 묵과 담채. 도쿄국립박물관, 도쿄. |
그런데 도쿄의 국립서양미술관에 새로운 전칭작 표기법이 있더군요. 몇 년 전 국립서양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페르메이르의 『성 프락세디스Saint Praxedis』1655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 미술관에 페르메이르 작품이 있다고?’ 현존하는 페르메이르의 작품이 35점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 한 점이 이 미술관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휠록Arthyr Wheelock 페르메이르 작품 도록1997에는 『성 프락세디스』가 개인 소장품으로 소개돼 있으니까요. ‘도록에는 여기 미술관 소장으로 돼 있는 작품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이 작품의 정체는 뭐지?’
작품 캡션에 답이 있더군요. 여러분도 아래 작품 캡션 속 네 언어별 설명의 첫 줄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작품 캡션에 대한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곳 미술관의 작품 캡션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네 가지 언어로 표기돼 있습니다. 일본어는 모르니 일단 패스하고 영어 설명을 읽어보니 “Attributed to Johannes Vermeer1632-1675, Saint Praxedis1655”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런데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에 귀속1632-1675 성 프락세디스1655”라고 적혀 있는 한국어 설명이 낯설었습니다. ‘귀속’이라는 단어를 미술관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물론 ‘~로 귀속되다’라는 표현을 알고는 있었지만, 작품 설명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죠. 그런데 한국어 설명뿐만 아니라 일본어와 중국어 설명에도 ‘귀속’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더군요. 일본어를 모르지만 자세히 보니 일본어로 적힌 화가 이름 뒤에 ‘歸屬귀속’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한 번 살펴보세요. 사진 초점이 살짝 흔들려서 글씨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중국어 설명에는 제가 모르는 한자로 이루어진 화가 이름 앞에 ‘归属귀속’이 붙어 있고요. ‘歸屬귀속’이 ‘전傳’을 나타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도쿄국립박물관에서는 전칭작에 ‘전伝’을 사용하는데 같은 공원 안에 있는 이곳 미술관에서는 ‘귀속歸屬’을 사용하다니 신기하죠?

 |
| 전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성 프락세디스』, 1655년. 캔버스에 유화, 102 × 83 cm. 국립서양미술관, 도쿄. |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 이곳 미술관에 있는 『성 프락세딕스』는 페르메이르의 진작 35점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휠록 도록에도 실려 있는 바로 그 작품이더군요. 개인 소장자가 미술관에 장기 대여를 해주고 있답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이 작품을 진작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출처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미술관이 “귀속”이라는 설명을 덧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전칭작을 표기하는 방법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어떤 표기 방법이 이해하기 편하세요? 비교 대상이 많지 않아서 대답하기 난감하시다고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다니다 보면 전칭작 표기 방법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겠죠? 세상에는 제가 아직 못 가본 미술관과 박물관이 수두룩하니까요. 여러분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눈을 크게 뜨고 새로운 전칭작 표기법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