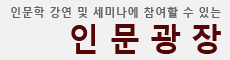국가는 인구의 수와 가구의 형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규율하며 통치성을 발휘한다. 이러한 가점제는 아파트 분양 시 보이는 높은 경쟁률과 자가에 대한 절실한 열망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높은 통치 효과를 발휘하며 결혼과 출산, 가족 구성을 유도해왔다. 이것이 국가가 주택을 통해 개입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며, 국가는 이를 통해 인구를 관리하는 한편 가족의 부양에 대한 책임을 그들 자신에게 부과한다.
주택공급 차원의 통치가 추첨제·가점제로 이루어진 청약이었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통치는 금융자본주의와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실현되어왔다. 대표적으로는 모기지론이라고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에서 특정 인구군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선별적으로 자가 소유를 용이하게 했다. 다자녀, 신혼부부, 노인부양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어 매달 내야 하는 이자의 금액을 줄여주는 식이다. 이러한 혜택은 국가가 주거와 경제적 유인을 통해 개인의 삶을 조정하고 그에 개입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라는 기조는 마치 시장에서 개인들이 펼치는 경제활동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고 시장의 원리, 이익과 독점의 원리에 의해 내버려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는 이러한 유인과 동기 부여를 통해 할 수 있는 한 많은 조정과 개입을 활용하여 주택을 매개로 국가와 가족을 연결하고 이를 질적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국가가 특정 인구군을 대상으로 저출산의 극복, 가족부양의 유도, 부양의무제의 적용과 자산 확보를 함께 기획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뿐더러 심지어 ‘옳은’ 일로 여겨지며, 국가에서 지지하는 가구의 형식과 삶의 내용을 구성한다. 예컨대 국가에서 다자녀 가구에 애국자 프레임을 부여하는 것은 그들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한 결과다. 그리고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아이를 많이 낳고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국가가 안정적 주거 환경을 부여하는 것을 승인하게 한다. 이는 전통적인 한국사회가 지향해온 가치라는 점에서 가족주의를 옹호하고 개인주의를 퇴행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럼에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통치전략의 균열을 보여준다. 젠더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통치의 결과인 것이다.
사회가 감당할 복지를 자가 소유와 주택의 금융화로 대체해온 국가에서 가족에게 부과되는 복지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결혼과 출산, 양육을 통해 가족을 이루는 것은 상호부조가 가능한 소규모의 체계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이 체계가 가족 간 소득의 분배, 가족복지, 계급재생산을 통해 기능한다. 결혼은 가족 형태에 법적인 위상을 부여하거나 그 제도를 안정시키는 실천으로 간주된다.
─ 최시현,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 창비2021, 90~9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