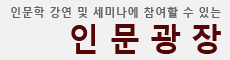장애disability는 단지 몸의 특정한 기능이 결여dis-ability된 상태가 아니라 ‘정상이 아닌 몸’이라는 사회적 평가를 획득한 일종의 신분지위에 가깝다. 따라서 고도로 발전한 테크놀로지가 기능의 결여를 보완한다 해도 여전히 장애는 존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얼마쯤 미래에 내가 보스턴다이내믹스 사에서 제조한 산악 등반용 웨어러블 로봇을 몸에 걸치고 북한산 정상에서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에베레스트_기다려 #휠체어_등반가 #강연_문의는_프로필에을 하더라도, 거창한 슈트 안에 휘어지고 짧고 비대칭적인 신체의 내가 있다면 여전히 나는 장애인으로 여겨질 것이다. (155쪽)
어쩌면 미래의 기술, 미래의 과학은 장애인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발전은 분명히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장애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결함 없는 완전한 기술을 거머쥘 수 없고, 불멸에 도달할 수도 없다. 대신 우리는 다른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바로 능력차별주의를 끝내는 것. 그것은 손상과 취약함, 의존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278쪽)
― 김초엽·김원영, 『사이보그가 되다』, 사계절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