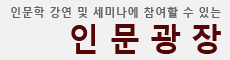심지어 독서가 기적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꽤 유명한 지도서에서는 책을 많이 읽어서 공부를 잘하게 된 나머지 학교 수업을 시시해하는 아이를 영웅시하기도 한다. 게임과 연예인의 ‘나락’에서 어린이를 구원하려면 책을 읽히라고도 한다. 설령 책을 많이, 잘 읽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독서의 목적을 성적에 두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책을 많이 읽어서 학교생활이 재미없어졌다면 독서가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 셈이다. 게임을 하고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은 요즘 어린이의 생활에서 일부분일 뿐 잘못이 아니다. 그런 어린이도 얼마든지 책을 좋아할 수 있다.
독서를 학교 공부의 배경 지식을 쌓는 도구로 여기는 책도 많다. 읽은 책이 그렇게 활용될 수야 있겠지만, 교과 연계에 연연하다 보면 독서의 폭이 좁아진다. 책을 직접 고르는 즐거움이나 책이 주는 여운을 간직하는 기쁨은 기대하기 어렵다. ‘몇 학년에 갖추어야 할 어떤 독서 능력’ 식의 설명도 마찬가지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나는 어른이 어린이의 독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기조를 본 듯해 마음이 불편했다. 어린이도 역시 ‘독자’라는 사실은 모른 척하고 가르칠 대상으로만 보는 것, 어린이의 생활과 개성을 무시하고 책 읽기를 최우선 가치로만 여기는 것이 과연 어린이와 책 사이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
초보 독자일지언정 어린이도 독서의 세계에서 어엿한 시민권자다. 같은 책을 읽었다면 책에 대해 느끼고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어린이에게도 어른과 동등하게 주어진다. 분야에 따라서는 어른보다 심오한 독서를 할 수도 있다. 책이야 적게 읽을 수도 있고 많이 읽을 수도 있다. 어린이는 독서라는 광대한 세계에 발을 딛고 한 권 한 권 읽어 가며 각자의 탐험을 한다. 안내자가 필요하지만 안내자의 의견만 따라다녀서는 안 되고 사실 그럴 수도 없다. 주입식 독서 교육에 지친 어린이는 책의 세계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떨어져 나가거나, 수동적인 독자가 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