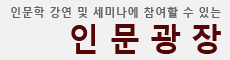그 상을 받았을 때 무척 기뻤다. 학교 선생의 편애와 비호 없이 외부 심사로 정당하게 받은 유일한 상이었다. 정호인은 전교생 앞에서 수여식을 하고 상장을 본관 중앙 게시판에 붙여두었다. 도 대항 핸드볼 대회 준우승 상패, 교육제도 개선 노력으로 교육청에서 받은 공로상, 학업 관련 표창장, 재단의 각종 교육 공헌 자료들과 함께 정소명의 상장이 게시되었다.
그곳을 지날 때면 스스로에게 조금 너그러워졌다. 한참 지나고 나서 자신이 쓴 원고를 국어 선생이 수정하여 응모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는. 당황한 표정을 짓는 정소명에게 선생은 의아하다는 듯 “당연하지 않니?” 하고 되물었다.
정소명은 자부와 수치를 동시에 준 그 상장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수상자 이름과 학교명 밑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다. 오래전의 관습으로 상장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넣은 것이다. 규모가 큰 대회여서 보다 공식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정소명이 전학 간 후에도 정호인은 상장을 계속 전시해두었다. 그러는 동안 재학생뿐 아니라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정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상장을 보았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무람없이 그 정보를 사용했을 것이다.
(…)
정호인에게 이 사실을 말해줄 수도 있었다. 신원을 도용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애당초 신상을 만천하에 공개한 건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리해서 키운 전장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낱낱이 드러낸다고.
― 편혜영, 「후견」 『어쩌면 스무 번』, 문학동네2021 167~16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