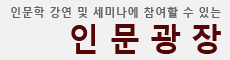(…)
동화의 독자인 어린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이다. 격식이나 지식의 권위 같은 겉치레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가장 자유분방한 문장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다.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모두 말이 되어 튀어나온다. 신기하거나 놀라운 것이 있으면 바로 말이 된다. 말의 규칙을 바꾸어놓기도 한다. 그 예로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반갑습니다람쥐!” 같은 말놀이는 어린이의 자유로운 입을 통해서 빠르게 번져 나갔다.
세태를 선명하게 반영하는 것도 어린이들의 말투다. 언제부터인가 ‘허걱’ ‘헐’ 등의 추임새만으로 얼버무려 대화하는 어린이가 늘고 있다. 이런 경향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 주관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방관자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요즘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거듭되어도 그에 대한 뚜렷한 의견을 표명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 집단적 공격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들 사이에 ‘와!’ ‘우와!’ 같은 긍정적 추임새보다 ‘헐’과 같은 부정적 추임새가 많아진 것에도 주목할 만하다. 반가운 일보다 답답한 일이 많은 것은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우리 동화에서 인물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우물거림이 많아진다거나 인물의 동선이 좁은 영역에서 움을 파는 소극적 구성이 많아지는 것은 아이들의 처지는 물론 글을 쓰는 어른들의 우울함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긴말을 덧붙일 여력이 없는 팍팍한 경쟁의 나날, 어딜 가도 비슷해 보이는 사정이 이야기의 맥을 약화하고 있다.(5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