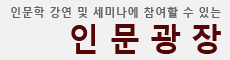애도에는 죽음과 상실이 앞선다. 상실이라는 구멍은, 우리가 가졌다가 잃은 것이 무언인지를 알려주는 기호다. 또한 우리가 욕망하고 바라왔던 것, 가졌다고 상상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추는 어둑한 거울과도 같다.
한 공동체가 슬퍼하기로 결정한 죽음을 들여다보면 그 사회가 욕망하는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생각하도록 주어의 영역을 확장해 준다. ‘무엇을 애도하는 사회인가’, ‘이 죽음은 애도할 만한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과정은, 적어도 그 사회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정도는 눈치챌 수 있게끔 한다. 기저에 깔려있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만 위에 죽음과 상실이 하나의 예시로 얹힌다. 단편적이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충분히 제시하는 그 사례로 인해, 어렴풋했던 문제는 사람들이 이입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가 된다.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게 한다.
애도는 이때 정치로 흐른다. 공적 애도 안에서 자주 가치를 다투는 씨름판이 벌어지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힘겹게 겨루기를 펼치는 일은, 그래서 자연스럽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사유하고 고쳐나가려는 시도 안에는 성실한 슬픔이 깔려있다. 이럴 때 사회적 애도를 지나치게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라며 사적인 영역에만 밀어 넣으려 하는 건, 개인의 애도 과정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 사적이라는 건 보이지 않도록 감춘다는 것과도 비슷한 질감의 단어다. ‘애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구호는 국가나 기업이 다루기에 까다로운, 감정을 가진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애도의 사적인 속성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시위로 이어지는 공적 애도의 진정성을 두고 매번 시비가 붙는 건, 사회의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도 보인다.
― 김인정, 『고통 구경하는 사회』, 웨일북2023, 258~26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