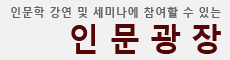하찮음, 쓸모없음, 짐 덩어리, 못난이, 열등함. 여기까지 듣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전부 오늘날 노인을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노인’ 자리에 갓난아기, 장애인, 혹은 특정 인종을 갖다 놓더라도 말의 앞뒤는 여전히 막힘이 없다. 요즘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중 어느 하나에도 걸리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이 단어들을 하나씩 뜯어볼까 한다.
뭔가가 ‘하찮은지 아닌지’ 여부는 현재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으며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에 좌우된다. 한마디로, 판정 결과가 심판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소리다.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분야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주요 인사로 대우받는 것처럼 말이다. 이 개념은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속한 세계, 자신의 세계관이 남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생겨난다. 자연스럽게 이 개념이 언급되는 상황의 배경에는 화자話者가 존재함을 암묵적으로 알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만 봐도 그렇다. 이 도시에 유난히 몰려 사는 젊은 IT 개발자들은 평범한 대화에도 괜히 전문용어를 남발한다. 이것은 나와 남 사이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긋는 의지의 표현이자 사회 구성원을 요즘 사람과 ‘노인네’라는 딱 두 종류로 양분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평범한 90세 노인이 최첨단 공학 기술에 빠삭하다면 정상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약관 청년도, 마흔 장년도, 예순 중년도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다.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관련 상품 한두 가지를 매일 사용하긴 해도 대부분 IT 기술을 잘 모른다. IT 개발자들의 시선에서는 이 사람들 전부 하찮은 인간인 셈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은데, 위대한 IT 천재님들은 애초에 누구를 위해 제품을 개발하는 건지?)
(…)
생명의 값어치를 오직 쓸모 있고 없고로만 매기는 것만큼 경솔한 짓은 없다. 그럼 어린이는 어떻게 되는가? 타고나기를 행동이 굼뜬 사람은? 재주가 부족하거나 원래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다면? 몸이 아픈 환자라면? 명석하지만 약삭빠르지도 않고 출세 욕심도 없는 사람은? 특히, ‘나약한 성별’ 혹은 ‘열등한 인종’은? 인간이 가진 온갖 편견을 다 갖다 대서 이래 제하고 저래 빼다보면 멀쩡한 사람은 몇 남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무용지물 낙인을 받고 버려졌다. 게다가 살아남은 극소수도 몇 년 뒤에는 똑같은 신세로 전락할 게 뻔하다. 만약 경제 생산성이 보살핌과 동정을 받아도 좋다는 누군가의 자격을 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면, 우리는 모두 큰일 난 셈이다.
― 루이즈 애런슨, 『나이듦에 관하여』, 최가영 옮김, Being2020, 571~57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