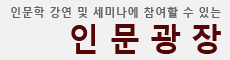오늘날 일본 사회가 식탁 위에서 〈개방형+공간전개형〉 상차림을 실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세기 말부터 국가에 의해 진행된 ‘근대적 위생’ 관념에 대한 계몽과 국민훈육이 있었다. 이와 달리 한국 사회는 식민지와 한국전쟁, 그리고 국가 주도로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의 복잡하고 드라마틱한 시간을 경험했다. 그런 와중에 정부가 국민의 식탁 위에까지 ‘위생의 근대성modernity’을 확산시킬 여유가 없었다. 1960~70년대 독재정부는 식탁 위의 위생보다는 식량정책을 앞세워 쌀밥을 적게 먹고 보리밥이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도록 하는 데 더 열중했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갑자기 한국 사회의 경제력이 늘어나자 한국인들은 다양한 음식과 조리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잘’ 먹는 문제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 이후 1990년대를 거치면서 오래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기 시작해 음식문화에서도 〈공통형+공간전개형〉 상차림이 오래된 ‘전통’인 양 강조되었다. 2000년대 이후 한류붐이 일어나면서 한국 문화, 특히 음식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외국인들은 〈공통형+공간전개형〉 상차림 방식을 한국 음식문화의 특징으로 여기며, 새로운 문화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당신의 반찬을 공유하라”며 한식의 〈공통형〉 상차림에 적응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21세기 초입의 오늘날 한국 사회는 여전히 상차림 방식에 대해 좀 더 종합적인 문제 제기 없이 한식음식점의 ‘경제성’ 혹은 한식의 ‘서양화’를 내세우며 이런저런 상차림 방식을 소비하고 있을 뿐이다.(254~255쪽)
*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인의 ‘밥>국>반찬’의 식사 방식에 붕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로 1990년대 이후 곡물 밥의 섭취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농림축산부의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2014》에 따르면, 1995년까지 한국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00kg대를 유지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80kg대로, 그리고 2012년에는 60kg대로 줄어들었다. 1970년만 해도 1인당 보리 소비량이 37.3kg에 달했으니, 쌀과 보리를 합치면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73.7kg에 이르렀다. 하지만 1985년에는 1인당 연간 보리 소비량이 4.6kg에 그쳤고, 2013년에는 쌀과 보리를 합쳐서 겨우 68.5kg을 먹었다.
적어도 천년 이상 지속되어온 ‘밥>국>반찬’의 식사 방식이 오늘날 점차 붕괴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가 바로 고염식, 즉 나트륨의 과도한 섭취다. 원래 곡물로 지은 밥을 많이 먹을 경우 식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염분으로 맛을 낸 국이나 반찬을 함께 먹게 된다. 즉, 곡물 위주의 식습관은 자연스럽게 고염식 식단으로 이어지는데, 만약 곡물 밥을 줄이게 된다면 그만큼 국과 반찬도 염도를 낮추어 요리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인이 밥과 함께 먹어온 국과 반찬의 맛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생각하기에 좋은 맛’이기에 이미 굳어진 고염식 식단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 여기에 해장국·찌개·전골 같은 메뉴를 단독으로 판매하는 음식점이 등장하면서 짠맛의 국과 반찬의 소비량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275~277쪽)
─ 주영하,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휴머니스트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