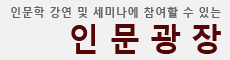성공한 화이트칼라 전문직투자 은행가를 비롯해 변호사, 로비스트, 테크 노동자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도덕적 비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한 이 비난은 훨씬 덜 뼈아프고 훨씬 덜 파괴적이어서 그들의 소득에, 위상에, 존엄성과 자존감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금융 붕괴 이후에도 과거와 다름없이 고액의 상여금을 받는 은행가들은 더티 워커는 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낙인을 ‘관리’할 수 있었다. 그 한 방법은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것이었는데, 이처럼 미덕을 내보이는 행위가 가난한 노동자에겐 애초에 불가능하다. 또한 설령 누군가 그들의 직업을 탐탁잖아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우월하고 특별하다는 태도로 타인의 비판을 훨씬 더 쉽게 무시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많은 투자 은행가가 자신이 얼룩지고 에누리당했다는 감정을 느끼기는커녕 금융업이 부당하게 규제당하고 비난받게 생겼다며 분개하고 억울해했다. 바로 이것이 정치철학자 마이크 샌델이 말한 “능력주의의 오만”, 즉 일류 법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공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딴 엘리트 계층의 과도한 자기애다. 성공은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는 능력주의 사회는 선망받는 엘리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각각의 소득계층과 각각의 직업 경로로 밀어 넣는다. 샌덜이 지적한 대로 이 시스템은 일류대학 학위가 없고 근 몇십 년간 소득이 줄거나 정체되고만 있는 노동자계급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깎아내려왔다. 그와 동시에 초고학력으로 성공한 사회의 ‘승자들’에게는 빛나는 도덕적 자격을 쥐어주며 “성공을 오로지 저 자신이 노력한 결과요, 제 미덕의 척도로 여기라고, 그리고 불우한 사람을 깔보라고” 부추겨왔다.
성공한 능력주의자의 오만은 정당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초고학력으로 성공한 사람은 너무도 흔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성공한 능력주의자가 오만한 이유는 그처럼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마저 자신을 부러워하고 우러러본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노동이 더티 워크가 되려면 ‘선량한 사람들’, 이른바 점잖은 사회 구성원이 도덕적으로 더럽다고 여겨 그들 스스로는 절대 하려 하지 않는 일이어야 한다. 교도소와 정육공장의 노동, 드론 전투원의 노동, 시추선 잡역부의 노동이 그런 일이다.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사이트 안정성 엔지니어의 노동, 월스트리트 은행가의 노동은 그런 일이 아니다.
(중략)
하지만 설령 구글 내에 이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불쾌하게 여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얼마간 존재한다해도 그것을 구축하고 설계하는 일에 자신이 연루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 각자는 그보다 더 평범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놀란은 말했다. “어떤 개인 정보를 수집할지 결정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서버를 관리하는 코드를 작성할 뿐이죠. 직접적으로 문제시될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나머지 수백 명, 수천 명은 배관 수리, 청소 등 집안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시다시피 집안일엔 잘못이 없잖아요.” 놀란은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렇게 자기하고 직접 관계되지 않은 듯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산하기가 아주 쉽죠. 저에겐 프로젝트 메이븐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내가 요청받은 업무는 잣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날려버릴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받은 거예요.”
기술만으로 책임이 완벽하게 분산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드론 부대의 영상 분석가는 파괴된 집, 산 채로 불타는 사람 같은 생생한 폭력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그로 인해 심각한 감정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의 엔지니어는 그런 영상을 접할 일이 없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불러일으키는 결과에서 멀리 떨어진 채로, 본인도 정확히 모르는 목적을 가진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놀란이 지적한 대로 그 한 가지 이유는 기술이 특정한 용도로 설계되었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기가 매우 쉽다는 데 있다. 가령 공장에서 탱크를 만드는 노동자는 그 물건이 어떤 목적에 쓰일지 잘 아는 반면, 코드를 작성하는 노동자는 그렇지 않다. “코드는 훨씬 더 유연합니다. 테크업계에서는 원래 A라는 목적으로 구축하거나 설계한 코드를 아주 쉽게 B라는 사악한 목적에 돌려 쓸 수 있어요.”
기업은 이 유연성을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의 실체를 감출 수 있으며, 잭 폴슨도 그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의 경우 구글 직원들은 “자기가 열중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심지어 프라이버시 평가팀조차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여기에다 노동이 구획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를 가중한다.
― 이얼 프레스, 『더티 워크』, 오윤성 옮김, 한겨레출판2023, 438~44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