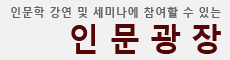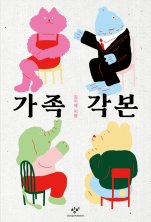저출생으로 온 나라가 걱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수년째 OECD 국가 중 가장 낮기도 하지만 1명이 되지 않는 수치는 단연 독보적이다.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준이 무의미할 정도다. 인구가 소멸해 나라가 없어진다고 난리다. 초저출산으로 진입한 게 2002년인데 20년이 지나도록 대응책이 별 효과가 없었던 게 분명하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싶어질 정도다.
“이 와중에 동성결혼이라니?” 저출생으로 나라 사정이 급박한데 동성결혼이 무슨 소리냐고 어떤 사람들은 기겁을 한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면 인구가 더 줄어들 텐데, 지금 상황에서 꺼낼 얘기는 아니라는 거다. 2018년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한 후보가 동반자 관계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하니, 다른 후보가 동성애를 ‘인증’하는 제도가 아니냐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동성애가 인증인정될 경우에 (…) 출산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한데요.”
한데 동성결혼과 출생률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언뜻 생각하면 생물학적으로 임신·출산이 불가능한 동성커플이 결혼하면 출생률이 더 낮아질 것 같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다. 동성끼리의 출산이 불가능한 건 결혼이 인정된다고 해서 새롭게 생기는 일이 아니다. 결혼제도가 없을 뿐 동성커플은 지금도 있다. 이들을 억지로 떼어내어 이성과 결혼하게 만들고 출산을 강제하는 상상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동성결혼 법제화로 인해 출생률이 더 줄어드는지 설명이 안 된다.
게다가 엄밀히 말해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동성커플도 출산을 할 수 있다. 이미 난임부부가 부부 외의 제3자가 기증한 정자나 난자로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시술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임신·출산을 못하는 이성커플처럼, 같은 방법으로 동성커플이나 비혼독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 다만 국가가 ‘결혼’한 부부만 지원하는 것뿐이다. 그럼 동성커플도 결혼하게 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출생률이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중략)
생각해보면, 결혼이란 참 오묘한 일이다. 성대한 예식을 치르는 비용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인생 최대의 사건이다. 반면 엄청난 예식에 비해 정작 법적인 신고절차는 초라하기도 하다. 두 사람이 부부관계라고 신고하는 간단한 서류 작업으로 끝난다. 이때 화려한 결혼예식에도 단출한 혼인신고 서류에도 자녀계획이나 출산능력을 묻는 절차나 항목은 없다. 다만 성스러운 예식을 지켜보며 암묵적으로 사람들은 기대한다. 남녀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결혼은 당연히 출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왔다. 옛날얘기만은 아니다. 지금은 사람들은 누군가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아이는 언제 낳을 거야?”라고 질문한다.
(중략)
실제로 한국에서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결혼 밖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혼외 출생률은 2.5퍼센트였다. 2002년 1.4퍼센트였던 것에서 조금 올랐다. 이에 비해 칠레와 멕시코 등은 혼외출생률이 70퍼센트가 넘고, 아이슬란드와 프랑스는 60퍼센트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50퍼센트대이다. OECD 회원국 평균이 41.9퍼센트이고, 한국과 비슷한 나라는 일본2.4퍼센트 정도다. 합계출산율과 마찬가지로 혼외출생률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낮다.
어찌 보면 꽤 모순적인 현실이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한국은 2002년 이래 계속해서 초저출생 상태에 있다. 저출생과 인구위기를 논한 세월이 20년이 넘는데도 사람들이 모든 출생을 조건 없이 반기지는 않는 듯하다. 정말 인구감소가 걱정이라면 양육자가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결혼 밖’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건 있으면 안 되는 금기된 시나리오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름이 결혼 밖에서 태어난 사람, 소위 ‘혼외출생자’의 것이다. 공문서 작성 예시에 자주 등장하는 그 이름, ‘홍길동’이다.
― 김지혜, 『가족 각본』, 창비2023, 43~4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