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이 다른 이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영원은 참된 사람이 사는 나라예요. 모차르트의 음악이나 당신이 숭배하는 위대한 시인들의 시가 그 나라에 속하고, 기적을 행하고 순교자의 죽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위대한 본보기를 보여준 성인들도 거기 속하는 거지요. 모든 진실한 행위나 감정도 이 영원의 나라에 속하지요.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주목하지도 기록하지도 않고, 후세를 위해 보존하지도 않을지라도 말이에요. 영원의 나라엔 후세란 건 없어요. 현세가 있을 뿐이지요.
- 헤르만 헤세 지음, 김누리 옮김, <황야의 이리>, 민음사, 2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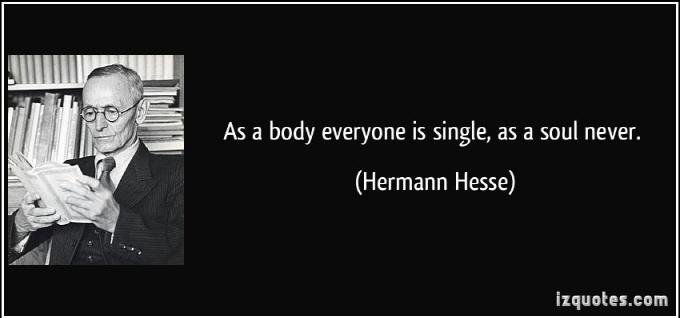
하리는 자신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헤르미네의 말을 경청한다. 헤르미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속의 가치가 지배하는 이 급박한 세상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없다고, 우리의 이 고뇌는 현세가 아니라 ‘영원의 나라’에서 비로소 그 목마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헤르미네가 이야기하는 영원의 나라는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다다를 수 있는 궁극의 초월적 차원이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의 대세와 유행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의 시간을 초월한 시간, 공간을 초월한 공간이다. 세상에 거처를 잡을 수 없고, 종교에 둥지를 틀 수도 없지만, 영원을 향한 이상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 그것은 하리가 꿈꾸는 줄도 몰랐던 자신의 이상이었다. 하리는 자신의 꿈이 헤르미네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바라보며 눈부신 희열을 느낀다. 전쟁과 폭력, 속물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에 증오를 느끼지만, 그 세상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었던 하리의 권태로운 일상이 헤르미네를 통해 구원의 틈새를 발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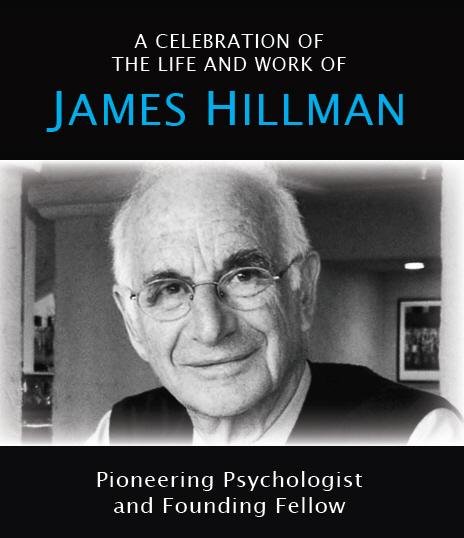
융을 계승하면서도 그를 넘어서려고 했던 심리학자 제임스 힐먼은 ‘영혼’의 위치는 육체도 정신도 아닌 제 3의 공간에 있음을 역설했다. 전통사회나 원시사회에서는 육체도 정신도 아닌 제 3의 위치, 또는 그 중간 위치에 ‘영혼의 장소’가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 영혼의 장소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인디언들처럼 모닥불을 피우고 다 함께 담배를 돌려 피우며 영혼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법을 알지 못한다. 영혼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제임스 힐먼은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영혼의 존재를 탐구1)했다. 영혼의 장소는 꼭 물리적 장소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추상적인 장소라고도 할 수 없는 곳, 즉 우리의 상상력과 환상성의 세계, 성찰의 세계라는 것이다. 물질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의 양쪽 모두에 속하지만 그 어느 장소로도 환원될 수 없는 장소에 영혼의 거처가 있다.
* 주
1) 제임스 힐먼의 논의에 대해서는 김재영의 논문, <칼 융 이후의 원형이론 : 앙리 콜벵과 제임스 힐만의 논의를 중심으로>(한국라깡과현대정신분석학회,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8(1), 2006.8, 59~85쪽.) 를 참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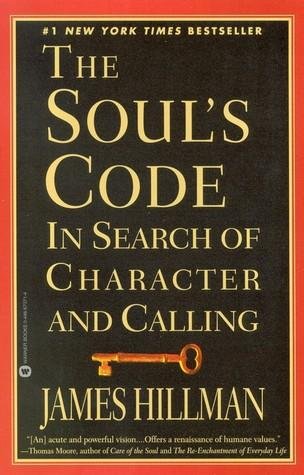
그 영혼이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탐구와 성찰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무엇이다. 제임스 힐먼은 심리학이 물리적인 것들만 연구하는 과학이 아니고, 또한 영적인 것들만 연구하는 형이상학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영혼의 존재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의 세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창조적인 주체가 될 때, 적극적인 주체로 거듭날 수 있을 때, 영혼의 존재도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즉 영혼이란 하나의 움직이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역동적인 사건, 항상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세계와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아파하고 깨질 때, 영혼은 비로소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낸다. <황야의 이리>에서 하리가 끊임없이 혼자만의 세계에 틀어박혀 있을 때는 그의 내적 이상이 아무리 지고지순해도 그 진면목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을 너무도 잘 이해해주는 진정한 영혼의 친구가 생기자,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한다. 그의 영혼은 드디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의 영혼은 운명의 부름에 응답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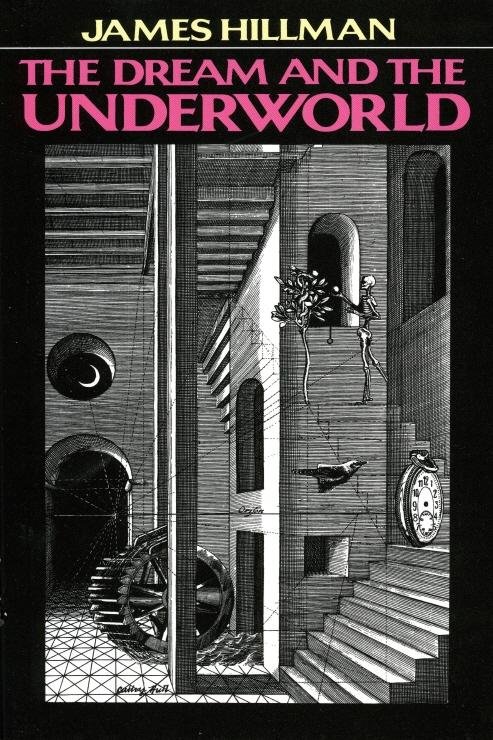
그것은 시간과 가상의 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하고, 우리의 고향은 그곳이며, 우리의 심장은 그곳을 향해 뜁니다. 황야의 이리씨,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동경하는 거지요.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의 괴테와 노발리스와 모차르트를 만날 것이고, 나는 나대로 나의 성인인 크리스토파와 필립 폰 네리 등을 볼 겁니다. (…) 아, 하리씨, 우리는 집에 가기 위해 이렇게 많은 진창과 넌센스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야만 해요! 우리를 이끌어준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길잡이는 향수지요.
- 헤르만 헤세 지음, 김누리 옮김, <황야의 이리>, 민음사, 218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