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빛을 찾을 수 있을까
하리 할러의 수기에는 ‘미친 사람만 볼 것’이라는 경고가 붙어 있다.
“고통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모든 고통은 우리의 고귀함에 대한 기억이다.” 대단합니다. (노발리스는) 니체보다 80년 전에 이런 말을 하다니! (…) “사람들은 대개 헤엄을 칠 줄 모르는 동안은 헤엄을 치려고 하지 않는 법이다.” 위트가 있지 않습니까? 헤엄을 치려고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물이 아니라 땅에서 살도록 태어난 거죠. 사람들이 사색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생활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지, 사색하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니까요! 그런 거지요. 사색하는 사람은, 사색을 본업으로 삼는 사람은 거기서 큰 진전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땅을 물이라고 착각하는 셈이지요.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익사할 겁니다.
- 헤르만 헤세, 김누리 옮김, <황야의 이리>, 민음사, 2013, 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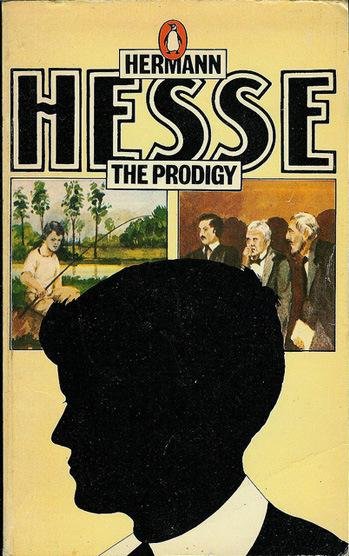
그곳에 가면 세속의 모든 번뇌를 잊을 수 있는 곳. 지나친 슬픔도 지나친 기쁨도 잦아들어 분노도 증오도 닻을 내리고 쉬는 곳. 신의 눈물과 신의 미소를 좀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곳. 그런 곳이 우리들의 성스러운 장소다. 융에게도 그런 내면의 성소가 있었다. 취리히 근교의 볼링엔이라는 고장에 소박한 이층집을 지어 별장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문명의 도구들을 내던지고 야생의 삶으로 되돌아갔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처럼 말이다. 울퉁불퉁한 돌바닥을 그대로 쓰면서 마루도 카펫도 깔지 않은 채 원시적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려 했다. 융은 엄청나게 밀려드는 환자들과 각종 업무로 하루종일 일 속에 붙들려 살았지만, 휴일에는 볼링엔에서 직접 청소와 살림을 도맡아 하며 원시인처럼 살아냈다. 그 속에서 그는 간결하고 소박한, 그리하여 아무 표정도 타인을 위해 꾸밀 필요가 없는 삶을 꾸려갔다.

융은 커피, 소시지, 과일, 빵과 버터로 아침식사를 직접 만들어 먹고, 아침에는 집필을 하고, 이후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했다. 그의 역작 대부분은 휴일에 집필되었다고 한다. 평일에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온갖 방문자들을 상대하다가도, 휴일에는 자신의 작은 별장에서 원시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했다. 그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의식과 바깥세상의 접촉면을 최소화함으로써, 무의식의 활동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예의와 체면을 중시하고 집단의 요구에 그때그때 반응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는 우리의 무의식이 자유롭게 뛰놀 수가 없다. 인적 없는 오솔길에서 조용히 산책을 할 때나 잠에서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외부의 지나치게 복잡한 자극으로부터 우리의 의식을 차단하는 내면의 성소가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다. 융은 자기만의 소중한 성소를 볼링엔 타워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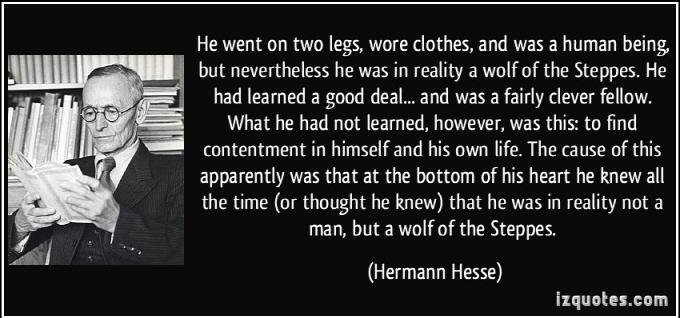
도시의 복잡한 생활환경 속에서, 대중문화의 시끌벅적한 유행 속에서는 진정한 자기를 찾을 수 없었던 하리 할러. 그에게도 또한 융처럼 자기만의 볼링엔 타워가 필요했다. 그는 가끔 최고의 교향악 연주 속에서 신의 금빛 발자취를 읽어내며 황홀경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런 순간의 자극만으로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에게는 몇 시간 동안의 콘서트홀보다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성소가 필요했다. 그는 어느 날 거리를 방황하다가 희미하게 반짝이는 광고판을 발견한다. 누가 이런 곳엘 오겠나 싶을 정도로 한적하고 허름한 골목에 보일 듯 말 듯 깜빡이는 광고판이 있었다. 놀랍게도 그 광고판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미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음. 할러는 흠칫 놀란다. 그리고 은밀한 기쁨을 느낀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내면의 성소가 바로 여기일지도 모른다는 은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한다. 스스로를 미친 사람이라 생각하는 할러야말로 이 마술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관객이었던 것이다.

아아! 우리가 영위하는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자기만족에 빠진, 이렇게 시민적인, 이렇게 정신을 상실한 시대 속에서, 이런 건축물과 사업과 정치와 이런 인간들 속에서 신의 자취를 발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는 이 세상의 목적에 공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도 나와는 상관없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한 마리 황야의 이리, 한 초라한 은둔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연극이고 영화고 차마 볼 수가 없고, 신문도 좀체 읽을 수 없으며, 최신서적도 거의 읽지 않는다. 만원열차와 호텔, 자극적으로 치근대는 음악이 울리는 꽉꽉 미어지는 까페, 우아한 사치 도시의 바와 버라이어티 쇼, 만국박람회, 경마장, 교양에 목마른 자를 위한 강연회, 거대한 운동장-나는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갈구하는 기쁨과 욕망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얻고자 아우성치는-원하기만 하면 나에게도 찾아올지 모르는-그 모든 기쁨을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도 없다.
- 헤르만 헤세, 김누리 옮김, <황야의 이리>, 민음사, 2013, 44~45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