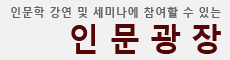‘천당 다음 분당’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살기 좋고, 집값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최초의 신도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화려한 분당을 매일같이 지나가는 나는 마음이 아릿하다. 강남을 개발하며 성남으로 내몰린 이들을,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가파른 언덕으로 다시금 내몰며 만들어진 분당이라는 도시에서, 그 이면의 그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 분당이라는 신도시를 만들 때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이 바로 분당선의 개통이다. 분당선이 처음 개통된 94년에는 지금의 3분의 1 정도인 오리~수서 구간만 개통되었다. 처음의 개통 목적이었던 ‘신도시 벨트, 분당-강남 연결’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였으므로, 수서~선릉 구간과 선릉~왕십리 구간이 차례로 개통되었다. 이로써 애초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지만, 용인시 수지구의 신도시개발에 따라 분당-용인-수원을 연결하는 연장 공사가 계획되어 오리~수원 구간이 2013년까지 네 차례에 거쳐서 개통되었다. 분당선의 연장은 곧 수도권 개발의 역사다. 수도권의 너른 들판을 마천루가 뒤덮을 때, 분당선은 그 뒤를 바쁘게 따라갔다.
이렇게 연장되는 과정에서 분당선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게 되었다.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 일대는 물론이고 용인 경전철이 연결되는 죽전 등의 용인 주거지구와 정자신분당선 환승, 서현, 야탑 등 분당 주거지구, 모란과 태평 등 기존의 성남 주거지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분당선 열차에 몸을 싣는다. 이 열차는 가천대학교가천대, 동서울대학복정, 한양대학교왕십리와 여러 대학들이 있는 2호선 환승역선릉, 왕십리 등에서 학생들을 내려주고 선릉, 선정릉, 강남구청, 압구정 등 업무지구에서 직장인들을 내려준다. 뿐만 아니라 2호선선릉, 왕십리, 3호선수서, 5호선왕십리, 7호선강남구청, 8호선모란, 복정, 9호선선정릉 등 다양한 노선들과의 환승 기회를 제공하며 주거지구와 업무지구를 왕복한다.

그런데 이 분당선 열차는 6량으로 10량 길이의 2호선 등에 비해 짧다. 게다가 배차 간격 또한 길게는 10분까지 늘어지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열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력질주를 한다. 그렇게 겨우겨우 열차에 올라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숨을 몰아쉬다가 주거지구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답답한 등하굣길을 매일 오가며 분당선의 연장이 과연 옳은 것이었나, 하는 의문을 가진다. 갈아타지 않고 출근하는 편리함을 위해 콩나물시루 같은 열차에서 하루의 피곤함을 더한다. 빠른 이동도 좋지만, 그 이동이 편안해야 할 것이 아닌가. 노선의 연장으로 이동의 편리함을 꾀했다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했어야 한다.
나는 이러한 기이한 상황, 즉 편리함을 위해 연장한 지하철에서 오히려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점점 더 도시와 산업화의 그늘을 목격한다.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시키기 위하여 학원가에 아이를 몰아넣어 정작 아이는 불행하게 만들고, 더 빨리 출근하기 위하여 무리해서 교통이 좋은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오히려 매일 고통스러운 아침을 보내고, 이 모든 것을 더 빨리 해내기 위하여 평화로운 미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허덕이는 것이 아닌가.
언덕투성이 성남 구시가지로 내몰린 ‘난쏘공’ 속 영희의 아들딸들을 가르치는 젊은 교사였던 우리 아빠는 가난한 학생들을 통해 나보다 이십여 년 먼저 도시의 그늘에 부딪쳤다. 한 칸짜리 반지하방이 오골오골 붙어 있는 가파른 언덕과, 논밭을 갈아엎고 높이 올라가는 분당의 마천루를 보며 사람 살 자리를 밀어 돈 자리를 만드는구나, 생각하셨다 한다. 그 체험은 고스란히 나에게 전해졌고, 나는 완성된 신도시 분당의 편리한 교통수단을 불편하게 이용하는 기이한 수혜자가 되었다. 신도시, 마천루, 지하철, 화려한 낱말들. 우리는 그 화려한 속도와 편리함이라는 말로 실은 피폐한, 속도에 내몰리는 일상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