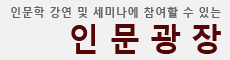(1) 금서와 아래로부터의 계몽주의
책과 독서에 대한 관념의 사회사를 지향하는 단턴의 기본 입장은 계몽주의에 대한 그의 독특한 시각으로 표출된다. 그는 계몽주의를 “교과서 작가들이 묘사한 심오한 여론”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문제a more down-to-earth affair”로 파악할 것을 촉구한다. 계몽주의는 볼테르, 루소, 디드로 등과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독점적으로 대변하는 철학 사조가 아니라, 좌절한 삼류 지식인들의 생활 터전, 곧 그들의 “빵과 버터의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몽주의는 ‘먹물들’이 펼치는 현란한 형이상학적 논리 게임이 아니라, 처자식 부양에 골몰하는 “육신을 가진 세속인men of flesh and blood”이 펼치는 눈물겨운 생존 게임이라는 것이다. 단턴이 계몽주의의 본질을 ‘아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재성찰할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계몽주의를 ‘거꾸로’ 뒤집어서 탐구하려는 지적 모험은 새로운 방법론과 새로운 사료 섭렵을 전제로 한다. 1960년대 후반에 부상한 ‘아래로부터의 역사학’에 책과 독서의 역사를 접목한 것이 단턴의 방법론이라면, 구체제에서 작성된 풍부한 금서 목록은 그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다. ‘밤栗’, ‘나쁜 책’, ‘철학적 서적’ 등의 은어로 알려진 금서야말로 ‘일상적 계몽주의’로 역사가를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된다. 그러므로 단턴이 보기에는 유명 작가나 철학자의 정전正典들을 끊임없이 분류·재분류해 저술된 기존의 문학사와 철학사는 시대착오적인 “일종의 고안물”이며 지루한 지적 유희에 불과하다. 당대인들이 호흡하던 실제 삶으로서의 계몽주의와 접속하기를 원하는 역사가는 제도권 문학계를 떠나 금서의 세계로 향하는 열차를 타야 한다고 그는 독려했다.
단턴의 분석에 따르면, 혁명 직전의 지식문화계는 구체제 정치 구조와 사회경제적 질서의 축소판이었다.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이 영역도 철저히 특권의 원칙에 따라 움직였다. ‘특수층le grand monde’으로 불리는 소수의 엘리트 지식문화층이 절대 왕정이 베푸는 각종 시혜-배타적 출판권과 아카데미 입회에 이르는-를 독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특권층에서 소외된 아웃사이더 지식인은 ‘슬픈 펜대’를 밑천 삼아 뒷골목을 승냥이처럼 어슬렁거리며 호구지책을 찾아야 했다. 문학적 상류층이 신분 사회가 보장하는 기득권과 절대 왕정의 후원 제도에 안주했다면, 삼류 작가들은 오직 재능(‘글발’)과 경쟁만이 생존의 법칙인 문예 공화국에 거주했다. ‘문단의 프롤레타리아트’, ‘시궁창의 루소주의자들’, ‘하위 인텔리겐치아’, ‘문화 부랑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진 이들 삼류 작가들이야말로 아래로부터의 계몽주의를 전파하는 원동력이며 나팔수였다.
권력층의 비호와 호의에 의존하지 않고 거친 문학적 언더그라운드를 지키는 문필가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을 구가했다. “가장 훌륭한 책은 가장 잘 팔리는 책이다”라는 출판업자들의 사업 방침에 철저히 호응해 삼류 작가들은 “팔리는 것이라면(빵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이든 쓴다!”라는 전투적 모토를 내걸었다. 이들은 책의 내용과 형식은 물론 도덕성과 합법성 여부에도 상관없이, 출판업자가 부추기고 독자들이 갈망한다면 무엇이든지 ‘써 갈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충만했다. 또한 당시 엘리트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사상을 극화, 단순화, 혹은 통속화해 일반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계몽주의의 비즈니스에 종사한 기업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런 의도로 무장한 통속 작가들이 몰두한 대표적 장르가 정치적 비방 문학libelles과 포르노그래피였다. 이 두 형식을 빌려 문필공화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실패한 인생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고 문화적 특권층에게 질투와 야유를 퍼부었다. 문화 권력들이 구체제가 표방하는 가치 체제(특권, 길드주의, 신분 사회)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 열중할 때, 삼류 작가들은 이에 대한 저항을 암시하는 메시지들(자유, 평등, 개인주의)을 ‘나쁜 책’으로 포장(위장)해 전투적으로 보급했다. 마르크스의 용어를 빌리면, 특권에 기초한 구체제의 독특한 문화적 생산 양식이라는 하부 구조가 아래로부터의 통속적 계몽주의라는 상부 구조를 잉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