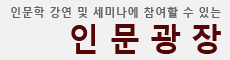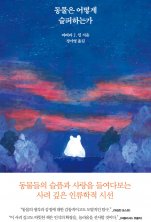새들의 사랑
일부일처제가 우리 인간 종에게 자연스러운 상태였던 적이 없다는 증거는 착실히 쌓여왔다. 여성과 남성 한 쌍을 중심으로 구성된 핵가족은 우리에게 진화적 과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심지어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핵가족은 전체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호모 사피엔스에게 장기간 한 파트너와만 지내는 상태는 비교적 드문 일이다. 왜 이 상태가 문화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상理想으로 여겨지는가는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중략)
자, 일부일처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다. 바라시와 같이 통념을 깨려는 이들이 그저 다른 통념의 씨앗을 뿌릴 따름이라는 것이다. 바로, 새들이 자신의 짝을 몹시 사랑한다고 믿는 것은 조금 순진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통념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 짝으로 지내온 새들이 정말로 서로에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까? 말레나를 돌보는 주민은 두 황새가 다시 만날 때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고 말한다. 설령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짝 외 교미가 있었더라도 원래 짝을 향해 애정을 쏟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사회적 일부일처제와 성적 일부일처제를 구별한다. 상대에게 성적으로 충실하지 않으나 계속해서 짝으로 지내는 동물들을 사회적 일부일처 동물이라고 본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나누는 것은 일리있지만, 새들의 삶에서 감정이라는 요소를 배제한다. 이 도식을 조류의 짝 외 교미에 상응하는 인간의 간통 행위에 대한 우리의 관념과 비교해보자. (178~180쪽)
*
황새, 백조, 기러기 같은 새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부일처와 연결돼 있다면, 까마귀류의 상징적 울림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까마귀와 큰까마귀는 미스터리와 모순의 새다. 그들은 계략을, 속임수를, 죽음을, 파멸을 상징한다. 하지만 동시에 창조력을, 치유를, 예언을, 죽음에 내재한 변형의 힘을 상징한다.
이렇게 죽음은 까마귀류가 지닌 양면적 상징 권력 체계상 어둠으로도, 빛으로도 통한다.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의미를 한 종류의 새에 부여하게 된 것일까? 하인리히는 자신의 책 『까마귀의 마음Mind of the Raven』에서 이 대조적인 테마들이 인류 역사의 각기 다른 단계에 등장한 것이라고 말한다. 큰까마귀는 우리 인간 종이 사냥으로 생존하던 때에 숭배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 시절에는 큰까마귀들이 날아간 곳, 큰까마귀들이 내려앉아 포식을 즐긴 곳을 찾아가면 커다란 짐승을 찾을 수 있었고, 그 고기로 인간도 삶을 지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후에 인간이 정착해서 가축을 길들이기 시작하자 죽음에 관한 까마귀의 상징성이 변화했다. 이제 큰까마귀는 도둑이 됐다.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고기를 훔치는 도둑이었다.
(중략)
하인리히의 견해에 따르면 목축이 시작됨에 따라 죽음과 연계된 큰까마귀의 상징성에는 파멸의 색채가 깃들었다. 그렇지만 인류학에서는 사냥과 목축을 단순히 연대순으로 차례차례 등장한 것이라고 보기보다, 인간이 저마다 주어진 환경 여건에 대응해 생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역동적이고 중첩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183~184쪽)
*
『까마귀의 선물Gifts of the Crow』중 한 장의 제목은 까마귀들의 「열정, 분노, 그리고 슬픔」이다. 이 장에는 시애틀의 어느 골프장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골프공에 맞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실려 있다. 물론 사고로 벌어진 일이었다. 하늘을 날던 까마귀가 곤두박질치는 광경을 걱정스레 바라보던 사람들은 곧바로 다른 까마귀가 도와주러 나타난 것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 이 까마귀는 공에 맞은 까마귀의 날개를 잡아당기며 내내 울부짖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까마귀 다섯 마리가 더 나타났다. “곧 세 마리가 협력해 죽은 듯 보이는 까마귀를 쪼고 당기기 시작했다. 양옆에서 날개를 지탱해 일으켜 세우려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공에 맞은 까마귀가 살지 못할 거라 생각했고, 경기를 재개했다. 그러다 두 홀을 막 지났을 때 골프를 치고 있던 다른 이들로부터 공에 맞은 까마귀가 살아서 날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일화에서 까마귀들이 다친 동료를 향해 연민을 표현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 까마귀들은 다친 동료를 죽일 때도 있다. 이따금 다친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무리 지어 괴롭히고 죽이기도 한다. 까마귀류는 복잡한 새다.
(중략)
두 사람은 이렇게 썼다. “우리는 까마귀가 짝이나 혈연의 죽음을 슬퍼한다고 추측한다.” 이 복잡한 생명체, 깃털 달린 유인원에 대해 이야기한 것들을 모아보면 나 역시 그렇게 추측하지 않을 수 없다. (190~191쪽)
― 바버라 J. 킹 지음, 정아영 옮김, 『동물은 어떻게 슬퍼하는가』서해문집,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