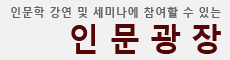프롤로그
저게 대체 뭘까 싶은 것에
즐겁게 몰두하는 사람들
오랜 친구 중에 화가가 된 이가 있다. 오랜 친구가 대부분 그렇듯,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쯤 만나는 가늘고 긴 인연을 어쨌든 이어오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중간쯤 되는 무료하던 시절, 우리는 때때로 각자 읽을거리를 들고 만나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까지 책을 보다 돌아오곤 했다. 읽을거리 중에는 가끔 『뉴턴』도 있었다. 진홍색 테두리의 과학 월간지. 그 안에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신비로운 성운과 은하의 사진이 잡지의 두 쪽, 때로는 네 쪽에 펼쳐져 있었다. 태양계 저멀리 타이완이라는 곳에도 험준한 계곡과 바다가 있다고 했다. 망망대해 위에 홀로 배를 탄 사람이 수평선 너머로 지는 거대한 토성을 바라보는 상상도도 실렸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잡지 속 우주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오랜 친구가 흔히 그렇듯 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지내다 문득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친구는 미술을 전공하는 유학생이 되어 있었다. 졸업하고도 계속 그림을 그릴 거라고 했다. 화가가 되면 뭐해서 먹고사느냐고 물었더니, 이래서 공대생은 안 된다고 했다. 나는 공대가 아니고 자연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 자연대 나온 천문학자는 돈을 많이 버느냐고 했다. 눈물 나는 노력 끝에 입학했다는 그 미술대학의 명성을 전혀 몰라 미안했던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사실 속으로는 조금 놀란 채였다. 뭐해서 먹고사느냐는, 걱정인 듯 걱정 아닌 그 질문을 내가 하다니. 나는 언제나 그 질문을 받는 쪽이다.
내가 천문학을 한다고 하면 상대방은 일단 눈을 크게 뜬다. “오, 신기하다”라고 거의 반사적으로 말한 다음, 내가 매일 밤 망원경으로 별을 보는지, 대학에서 별자리를 배웠는지 궁금해한다. 평소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는 사람이라면 며칠 전에 유독 밝은 별을 보았는데 그게 뭐였는지 묻거나, 근방에서 별 보기에 좋은 장소를 추천해달라고 한다. 별자리 운세에 나오는 황도 12궁이 13궁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 이도 더러 있다. 황도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고, 별자리는 항상 같은 곳에 있는데 지구가 자전할 때 팽이처럼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스르르 다른 쪽으로 기울었다가 하느라고 기준 면이 아주 조금씩 바뀌니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별자리 위치가 오늘날은 조금 틀어져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짐작 섞인 설명은 시작한 지 십오 초 이상 지나면 정적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기능이 있다. 상대방은 이미 내가 앉아 있는 뒤쪽 벽의 무늬를 감상하는 중이고, 나는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가만있자, 지구 세차운동 주기가 2만 5000년도 넘을 텐데, 그러면 황도 12궁이 정립된 게 적어도 만 년에서 오륙천 년 전이라는 건가? 주기 동안의 각도 변화량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아주 대단히 틀리진 않은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가 대단히 차분해졌네. 이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언가 다른 화제를 꺼내야 하는군. 무슨 말을 해야 자연스럽지?
그런 설명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경우는 내가 강연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서 있을 때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나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논란의 주인공인 뱀주인자리는 한쪽 끝이 황도에 약간 걸쳐 있어서 황도상의 중요 별자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무려 그리스시대부터 있었다고 한다. 나는 또 생각에 빠져든다. 황도상에서 각 별자리가 차지하는 넓이가 처녀자리 같은 것은 넓고 전갈자리는 좁은데, 그러면 생일 별자리를 나눌 때 실제 별자리의 크기에 비례해서 날짜 구간을 나눠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이렇게 얘기한다. “아, 뱀주인자리요? 그거 원래부터 거기 있던 거예요. 근데 자기 별자리가 뱀주인자리로 바뀐다고 하면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뉴턴』을 보면서 천문학자의 꿈을 키웠다고 하면 좀 멋있어 보일 텐데, 아쉽게도 그건 아니다. 잡지 속 설명은 읽지도 않고 멋진 사진과 그림을 보며 감탄할 뿐이었다. 가을로 넘어가는 여름의 끝자락에 동네 뒷산에 올라 군데군데 구름을 머금은 붉은 노을을 바라볼 때처럼.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서 특별한 재능을 발휘한 적도 없었다. 자율학습 시간에는 영어 독해 교재를 펼쳐놓고 이야기책 보듯이 지문만 읽거나, 오래된 팝송 가사를 베껴 적으며 시간을 보내는 때가 많았다. ‘문과’와 ‘이과’의 기로에서 내가 이과를 택하자 친구들이 비웃으며 장난하지 말라고 한 걸 보면, 확실히 ‘과학자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다. 각종 수학·과학 경시대회에서 일등을 휩쓰는 모범적인 사건도, 가전제품을 분해·조립하다 불을 내는 깜찍 발랄한 사건도 없었다. 적당히 성실하게 굴면 어른들은 쉽게 안심했고, 그러면 신임과 방임 사이의 어드메에서 나는 동네 뒷산을 쏘다니고 PC통신 속 세계도 실컷 돌아다녔다. 수도권 가장자리의 공업도시였다. 은하수가 수놓인 밤하늘도, 근사한 망원경이 잔뜩 세워진 가게를 들여다볼 기회도 없었다.
*
엉뚱한 시작이었다. 수업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뒤돌아 칠판에 바짝 달라붙더니 몸을 잔뜩 웅크려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는 칠판에 무언가를 표시했다. 수업은 열심히 하지만 학생들에게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주는 선생님은 아니었다. 재밌거나 반대로 성마른 사람도 아니었고, 담당 과목조차 국영수도 예체능도 아닌 지구과학이었다. 갑자기 너무 조용해져서 졸고 있던 학생들도 눈을 떴을 무렵, 선생님이 맨 뒤에 앉은 학생에게 물었다.
“내가 여기 점을 몇 개 찍었죠?”
“한 개요.”
맨 앞에 앉은 학생에게 똑같이 물었다.
“두 개요.”
연주시차였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매년 한 바퀴씩 돌면서, 이쪽 끝에 있을 때와 반대쪽 끝에 있을 때 별의 위치가 약간 다르게 보인다. 마치 왼쪽 눈만 뜨고 볼 때와 오른쪽 눈만 뜨고 볼 때 책상 위 물건의 위치가 달라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대신 멀리 있는 산이나 건물의 위치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다. 별도 마찬가지다. 멀리 있으면 지구가 6개월에 한 번씩 오른쪽 왼쪽에서 본다고 해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는 별은 위치가 달라 보인다. 반대로 말하자면 시차가 클수록 가까운 별이다. 지구가 일 년 동안 더 큰 원을 그리며 돈다면 별의 연주시차는 더 클 것이다. 거리와 각도, 시차를 설명하기 위해 칠판에 옴싹 달라붙어서, 모두가 보고 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애쓰며 점 두 개를 칠판에 찍고는 돌아서서 이토록 흥미진진한 것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던 그 순간, 무미건조한 중년 아저씨의 눈에서 반짝, 소년이 지나갔다. 술이나 산해진미도 아니고, 복권 당첨도 아닌데. 하다못해 아름다운 ‘연주씨’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연주시차. 지난 십몇 년 동안 한해에 예닐곱 반에서 똑같은 설명을 했을 텐데 어째서 연주 시차 따위가 저 사람을 그리 즐겁게 하는 것인지 몹시 궁금했다. 일 년 뒤, 나는 지구과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어쭙잖은 상을 탔다.
(본문 중 일부)
★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