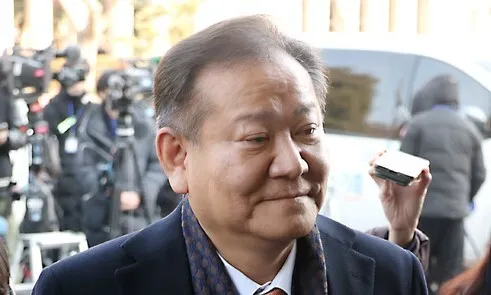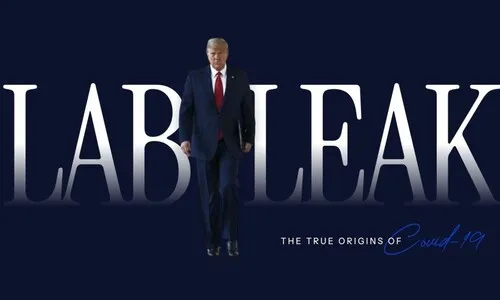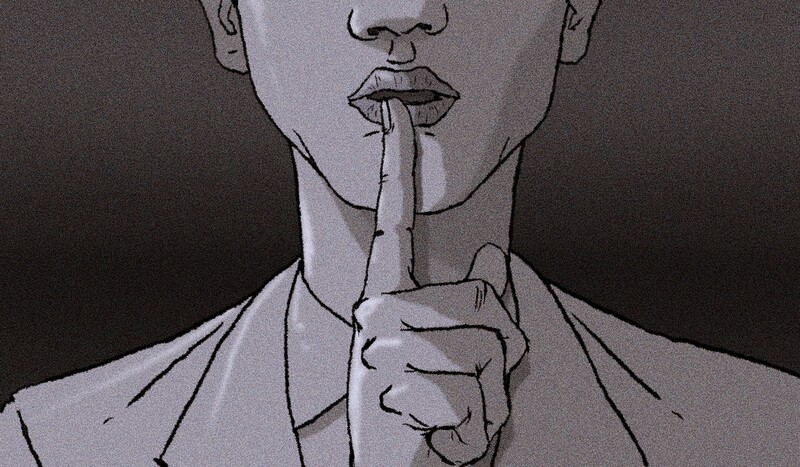

정끝별 | 시인·이화여대 교수
4월4일 오전 11시, 그리고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파면 결정문 낭독을 듣는 내내 말의 힘에 가슴이 뜨거웠다. 그렇지, 본디 말이란 저렇게, 힘 있고 아름다운 것이었지! 헌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헌법재판관의 품격과 위엄을 보여주는 문장이었다.
말로 세운 종교의 집이 경전이라면, 말로 세운 법의 집은 법전, 그중 헌법이다. 사실과 상식에 부합하는 법리 해석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결정문은 간결하고 명징했으며, 낭독하는 어조는 낮고 단호하게 강조할 데를 정확하게 짚어주었다. 특히 ‘보겠습니다’로 시작하여, ‘있습니다’와 ‘없습니다/않습니다’, ‘입니다’와 ‘아닙니다’, ‘됩니다’와 ‘합니다’로 이어지는 우리말의 종결어미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깨우쳐주었으며, 그 종결어들이 거느린 고뇌와 숙고가 충분히 전달되었다. 헌법의 주인이자 거주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살아있는 법의 말이었다.
지난 겨우내, 그리고 좀체 오지 않은 봄을 기다리던 3월 내내, 우리는 바벨탑에 갇힌 시민들이었다. 국회와 법정에서, 거리와 뉴스에서, 온갖 유튜브에서 뛰쳐나온 말들이 길길이 날뛰곤 했다. 같은 말을 제각각 다른 의미로 썼다. 하나의 말을 다른 말로 썼으며, 했던 말을 다른 말로 했다고 우겼다. 말에 의해 사실은 왜곡되고, 말 때문에 진실은 호도되고, 말은 갈라치기와 반목과 혐오의 무기가 되었다. 듣고 싶은 말만을 듣고, 되뇌며 믿으며, 상대를 악마화했다. 말의 칼을 서로에게 겨누는 말들의 전쟁, 그야말로 말의 내전이었다.
말이 존재의 집이라거나 세계를 바라보는 틀이라고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말이 씨가 된다거나 인간의 영혼이 말속에 유폐되어 있다고 새기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불행한 시간이었다. 말이 생각을 이끌고 삶을 이끈다고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런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최종 심급의 결정문은 엄중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었다.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다. 결정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6년 전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말도 날개를 달았다.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신” 분이라고 호명했던 김장하 선생도 재소환되었다. 역주행하는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를 나도 다시 보았으니.
“산을 가는 좋은 멘트가 있는데, 사부작사부작 꼼지락꼼지락, 그렇게 걸어가면 돼, 계속 그렇게 사부작사부작 가면 돼, 그 뒤에 이제 꼼지락꼼지락”. 말수 적은 김장하 선생이 어눌하게 한 말이다. 사부작사부작 꼼지락꼼지락, 작고 낮게 지치지 않고 행동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이 말은,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시의 언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 이 말은 얼마나 살갑고 사랑스러운지.
사부작사부작 꼼지락꼼지락은 얼마 전에 본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자락자락과 겹쳤다. “언 땅에 지 속 묻고 살아 낸 값, 이제야 가을걷이할래나 보다, 광례 감나무가 자락자락해, 자락, 자락”, 지치지 않아 지지 않은 애순이 계장이 되었을 때, 애순 엄마 광례가 심은 감나무를 보며 해녀 이모들이 했던 덕담이다.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는 풍성한 모양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이 자락자락이라는 말은 또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직한지. 이 전쟁 같은 날들에도 여전히 살 만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두 팔 벌려주는 시의 말들이다.
말은 그 시대의 거울이자 척도다. 말의 오염은 그 사회의 한계인 동시에 존재와 세계의 타락을 반영한다. 하나의 말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할 때 말은 타락한다. 말의 타락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혼란에서 비롯되지만 그렇게 타락한 말은 다시 정치적·경제적 타락을 증폭시킨다고 일갈했던 이는 조지 오웰이었다. 말이 타락하면 생각이 타락하고, 사회 전체가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게 된다는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다.
말과 칼은 두 얼굴을 가진, 닮은 소리다. 타락하면 흉기가 되고 괴물이 된다. 본디 말은 소통의 도구다. 자신을 세우고 서로를 이해하고 진실을 전달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법이 상식과 평등과 정의의 말이라면, 시는 감정과 감각과 느낌의 말이다. 헌법의 말이 정의의 보루라면, 시의 말은 진실의 보루다. “사회가 좀 겁을 내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겁내는 데가 없이 설치면 사회가 몰락하거든.” 김장하 선생이 한 말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칼을 보듯 말에 겁을 내야 한다. 아뿔싸, 다시 대선이 시작되었다. 스피커들이여, 나발수들이여, 제발 좀, 말에 겁을 내주시길!

![[포토] ‘똘레랑스’ 일깨운 홍세화 선생 1주기 추도식](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18/53_17449546297399_20250418501868.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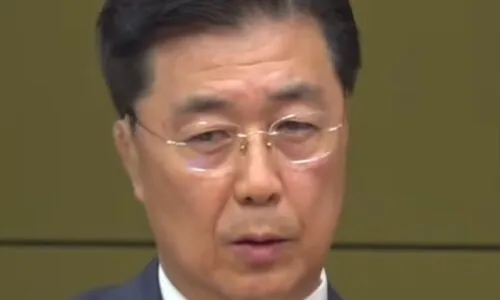




![[사설] ‘헌법 존중하라’는 퇴임 재판관 당부 새겨들어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8/53_17449688795351_20250418502743.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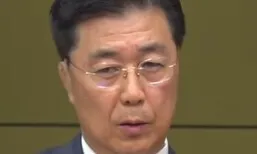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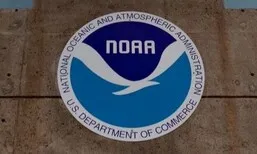


![[단독] 홍준표 쪽-명태균 1억원 돈거래 정황…“김영선 선거비용 5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5/53_17446987298565_20250415502731.webp)
![광장의 함성 뒤, 다시 꺼내 읽는 ‘세월호, 그날의 기록’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9/53_17450371823828_20250417504337.webp)






![검찰독재정권 2022.05.10~2025.04.04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04/53_17437558978226_20250404503237.webp)


![<font color="#00b8b1">[뉴스 다이브]</font> 윤석열 늪에 빠진 국힘, 손절 시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5/0418/20250418502139.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