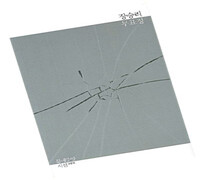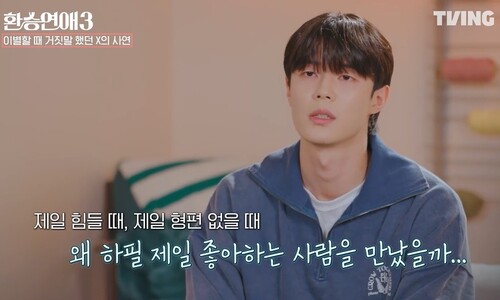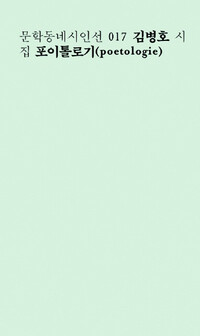
물리학을 전공한 1967년생 시인 김병호는(1971년생 동명이인 시인이 있다), 30년대의 이상(李箱) 이후로는 거의 처음으로, 이를테면 ‘이공계적 상상력’이 어떻게 시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 있다. 6년 만에 출간된 두 번째 시집 (2012)는, 6장으로 된 긴 논고의 곳곳에 40편의 시가 흩뿌려져 있는, 초유의 모양새로 나왔다. 타협하기보다는 더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이 실험을 지지하려고 한다. 그의 논변에 동의해서만이 아니라 시 자체가 충분히 흥미로워서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만 본다. (…) 잘못된 관찰은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모욕이다.” 이 주석을 앞세우고 이 시인은, 그의 것 중에서는 비교적 온건한, 이런 시를 펼쳐놓았다.
“그는 하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고정된 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늘의 작은 움직임이라도 보려면 하루 이상은 눈 맞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른 아이들은 흔들리는 땅을 바라보기도 버거운 두 살에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모두 볼 수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나뭇가지에 숨은 작은 새의 울음을 눈에 담았고 거기에서 하늘의 내밀한 속삭임을 품은 나뭇잎만 골라 작은 가방에 담았다.”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 시의 첫 단락이다. 두 번째 단락까지 가 보자.
“그의 머리가 처음으로 땅과 닿은 날은 하늘이 아닌 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 스물세 살의 가을이었다 처음 맛보는 편안함과 함께 그의 귀를 간질이던 수많은 소리들의 주인이 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어날 수 없었다 소리들에게서 시선을 돌릴 수 없었다 하늘의 썰미가 날카로워지는 봄이면 거기에 베어 대지의 핏발이 툭 터지는 걸 보았다 초록으로 핏물 배어 오르는 들길과 하얗게 상처 난 하늘길이 정확하게 같은 얼굴로 마주 보았다 눈 녹는 자리 드러나는 작은 돌처럼 초록 속으로 던져진 것이 사람이었다 사람을 보았다.”
이야기 하나가 어렴풋이 솟아오른다. 온종일 하늘만 바라보던 한 아이가 있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하늘의 작은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다. 남들이 땅을 볼 때 하늘을 보는 아이는 고독하게 자라 물리학도가 되었을까. 그러던 아이가 20년이 지난 어느 날 처음으로 땅을 보게 된다. “하늘이 아닌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다. 사랑에 빠지면서 그에겐 다른 세계가 열렸다. 기존 세계와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만큼 달랐을 것이다. 이 사랑은 어찌 되었을까. 마지막 단락을 마저 옮긴다. (인용이 너무 많다 싶지만 시를 중간에 끊을 수가 없다.)
“3백일 내내 먹구름 두터운 땅에 대고 하늘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이름을 부르는 일이 사람을 조금씩 덜어내는 일이란 사실을 사람에게서 아프게 배운 후였다 그가 지난 자리마다 얇은 각질처럼 떨어진 이름들이 아기의 쌔근거리는 호흡만 있어도 사각거리며 돌아누웠다 비 마른 아침 달팽이들이 그린 끈적이는 경로처럼 그가 사라진 공간마다 하얗게 쌓인 눈만이 그가 머물던 곳임을 말했다 그가 부를 수 있는 모든 이름을 불렀을 때 하늘은 햇볕에 마른 젖었던 책처럼 낱장으로 벌어졌다 그날 그의 눈에 남은 것은 처음 보는 이름 하나였다.”
그는 어쩐 일인지 다시 하늘로 방향을 튼다. ‘땅에 대고 하늘을 부르는’ 모양새다. 이미 안착했으니 땅을 벗어나기 어렵지만, 어떤 좌절을 경험하고 다시 하늘을 그리게 된 것이리라. 어떤 좌절? “이름을 부르는 일이 사람을 조금씩 덜어내는 일”일 뿐이라는 것. 네 이름을 부르는 날이 쌓여갈수록 너라는 세계는 야위어간다는 것. 이 시에 시인은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였다.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안에 있다가 ‘유한한 현실성’의 세계로 안착했지만 이내 절망하고 다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것, 이것이 ‘사랑 이야기’의 논리라는 뜻일까.
영화 에서 노시인 이적요의 문하생 서지우는 무기재료공학을 전공한 것으로 설정돼 있다. 이것은 그의 스승이 제자를 은밀히 경멸하는 이유이자 제자가 갖고 있는 콤플렉스의 한 근거로 그려진다. ‘공대생이 무슨 문학이냐.’ (물론 이것은 설정일 뿐 원작자의 본의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상은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에서 기하학과 물리학을 배운 뒤 경이로운 시를 써서 당대 한국시의 관습을 일소했고 이후 그의 이름은 불멸이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이상이 필요하다. 엇비슷한 시각으로 세계를 반복․재현하는 일은, 시인 김병호의 표현대로라면, “세계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이다.
문학평론가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소주만 한 병 딱…” 윤 발언 풍자한 YTN 돌발영상 돌연 삭제

다선 의원들 ‘우원식 의장’ 밀었다…‘이재명 일극체제’ 견제구

153일 만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용산 “적절한 시점”

의대 증원 예정대로…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정부 “의료개혁 큰 산 넘어”

“얼마 안되지만…” 부천 주민센터에 2천만원 두고 사라진 남성

정부 ‘의대 증원’ 속도 낼 듯…의사단체 “대법원 재항고”

“홍준표 눈썹 문신 누구한테 받았나…문신한 의사·판사 다 공범인가”

우원식, ‘명심’ 추미애 꺾었다…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호중 지우기’ 나선 방송사들, 분량 편집·캐스팅 조정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