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고결한 인간 정신의 발로라 할 수 있는 혁명은 왜, 국가권력을 장악한 뒤 전체주의로 퇴락하게 되었을까. 힘든 저항운동의 시절에는 동지를 가족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라면 고문과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이었을 텐데, 혁명 이후에는 왜 그 가까운 동지부터 의심하게 되고 숙청의 이름으로 제거하게 되었을까. 모두가 평등한 공산주의를 표방한 체제의 운영자들이 주변 사람을 아무도 믿지 못해 민주주의가 아닌 ‘혈통의 원칙’으로 권력 승계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꼭 혁명 정권이 아니더라도, 민주화가 된 이후 운동권 사이에 갈등이 커져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례도 많다. 권위주의 독재 때가 아닌 민주주의하에서 이들 사이에 증오가 더 커진다는 사실은 분명 놀라운 역설이다. 이와 관련해 성공회대 권혁태 교수로부터 이웃나라 일본의 경험을 자세히 들은 적이 있다. 일본의 경우 진보파 내부에서 있었던 린치 사건들을 ‘우치게바’라고 한다. 그것은 내부라는 뜻의 일본어 ‘우치’와 폭력이라는 뜻의 독일어 ‘게발트’(Gewalt)의 합성어다.
권 교수에 따르면, 1969~1999년에 진보파 내부에서 무려 1960건의 폭력이 있었는데, 사망이 113명, 부상이 460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수치도 놀랍지만, 폭력에 동반되었던 심리적 양상은 더 무섭다. 당시 한 정파가 발표한 문건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한다. “현관에서 과감하게 들어간 우리 부대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창문으로 도망가려 하는 ××에게 강력하게 쇠망치 한방을 가했다. 방바닥에 나뒹굴어 우리 영웅적 부대의 진격에 겁에 질려 있는 가족 앞에서 용서 없는 철퇴를 모든 힘을 모아서 전신 모든 곳에 가해 피바다에 침몰시켰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지만, 폭력 행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운동인데 이런 기회주의 내지 배신자들에게 뺏길 수 있겠냐며 분노했고, 그래서 당당할 수 있었다.
통합진보당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보파 내부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를 흔히 ‘정파 문제’라고 하고, 그 기원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노선 투쟁에 있었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정파 문제가 민주화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측면을 못 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시기의 운동이 반정치, 반권력, 자기희생의 열정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진보파들에게도 정치와 권력, 이해관계에 접근할 기회가 주어진다. 문제는 과거와 같은 운동의 논리로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일본의 우치게바 역시 ‘노선 전환’의 문제, 즉 전후 좌파가 민주주의에 적응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산주의 정권 내부의 폭력성 역시 혁명가들이 애초 이상한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혁명과 운동의 논리로 권력의 문제를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다. 권력 자원의 분배가 ‘옳은 노선의 원칙’에 의해 지배될 때, 역설적이게도 그 귀결은 이단과 음모 내지 권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내부 갈등이 폭력으로 넘어가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민주주의의 최대 매력은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이는 옳음이 아니라 설득력이 경쟁의 기준이 되고, 책임성의 윤리에 권력을 묶어둘 수 있기에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보려 하지 않은 채, “우리가 이 당을 어떻게 지켜왔는데”라거나 “우리들을 제거하려는 음모” 혹은 “피를 토할 것 같은 억울함”을 앞세우는 심리 속에는 민주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사설] 한 대행, 출마할 거면 당장 그만두고 국민심판 받으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24/17454900367696_20250424504005.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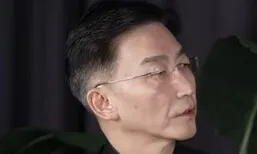







![‘김건희 선물용’ 다이아…건진법사는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 [4월24일 뉴스뷰리핑]](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24/53_17454544049271_20250424500549.webp)

![광장의 함성 뒤, 다시 꺼내 읽는 ‘세월호, 그날의 기록’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9/53_17450371823828_20250417504337.webp)





![검찰 눈엔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original/2025/0424/20250424504054.webp)



![<font color="#00b8b1">[뉴스 다이브]</font> 검찰 ‘내란 잔당’들의 수상한 움직임! ‘선거에 영향’ 기도하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24/53_17454759398103_20250424502861.webp)





![우원식, 한덕수 멈춰 세워 “할 일, 안 할 일 구분하시라” <font color="#00b8b1">[영상]</fon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5/0424/211745475105002.webp)

